대부분 기업은 시장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그러나 크리스텐슨 교수는 “(기존)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바로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다. 파괴적 혁신은 그가 발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요한 경영 이론으로 통한다. 동시에 기업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주간지로 전환하는 <이코노미조선>이 크리스텐슨 교수에게 파괴적 혁신은 무엇이고, 한국 기업이 어떻게 파괴적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 물었다.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됐다.

“2000년 현대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이후 한국 기업의 파괴적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크리스텐슨 교수에게 ‘한국 기업 중 파괴적 혁신을 이룬 기업이 있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현대차는 2000년 들어 아반떼, 쏘나타를 미국 시장에 선보였다. 가격 대비 좋은 성능과 ‘10년 10만마일 무상보증 프로그램’이라는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후 한국 기업 중 파괴적 혁신을 이룬 기업이 없다는 게 크리스텐슨 교수의 생각이다.
중소기업 희망 뺏는 한국 재벌이 파괴적 혁신 막아
그는 한국 기업이 지닌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자본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키우는 데 능하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찾는 중소기업, 기업가(entrepreneur)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심한 경우, 희망을 빼앗기도 한다.” 한국의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은 정보통신(IT)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헬스 케어(health care), 에너지, 로보틱스(robotics) 등의 산업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하는 파괴적 혁신이란 무엇일까? 그는 “파괴적 혁신 이론은 ‘좋은 회사가 왜 실패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며 말을 이었다.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신생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파괴적 혁신에 대한 연구는 이런 신생 기업이 선두 기업을 이기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신생 기업이 선두 기업과 단순히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비대칭적 경쟁(asymmetric competition)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선두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고객층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엔드(high-end)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인을 중시한다. △현 고객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한다.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한다. △소규모 시장보다는 대규모 시장을 공략한다.
하지만 파괴적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로엔드(low-end) 시장을 주목한다. 수익성이 떨어져 선두기업이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새로운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는 “파괴적 혁신은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거나,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게 그들의 첫 번째 무기”라고 설명했다. 선두 기업과 경쟁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게 그가 말하는 비대칭적 경쟁이다.
그는 소니(Sony)를 예로 들었다. 과거 소니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며 세계 전자제품 시장 리더로 성장했다. “소니는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같은 시장 선두주자가 판매하고 있는 테이블 탑 라디오가 아닌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시장에 내놨다. 당시 대부분 가정은 장식품 또는 가구 스타일의 테이블 탑 라디오를 사용했다. 소니의 라디오는 기존 라디오에 비해 음질이 떨어졌지만 값이 저렴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기존 시장을 파괴했다.”
파괴적 혁신은 선두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도 한다. 그는 “우리는 블록버스터 비디오(Blockbuster Video), 모토로라(Motorola) 등 세계적인 기업이 파괴적 혁신으로 인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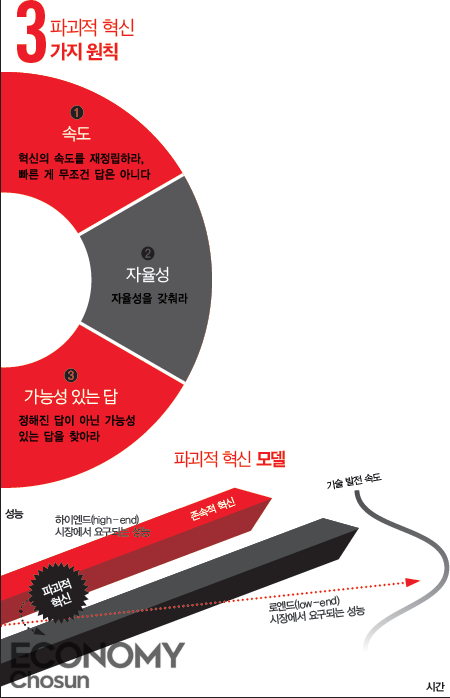
유능한 기술·비즈니스 모델·비소비자 세 박자 맞아야
크리스텐슨 교수는 파괴적 혁신을 논의하기 전에 유능한 기술, 저비용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성장 네트워크 등 3가지 핵심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능한 기술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든다. 저비용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을 많은 고객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팔 수 있게 한다.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비소비자(non-consumer)를 타깃으로 한 성장 네트워크는 산업의 변화와 창조를 유발한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100년 전 자동차는 부와 특권을 지닌 사람 몇몇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한다. 또 자동차는 도로 건설, 제조, 여행 등의 산업 발전을 이끌며 새로운 운송 시대를 열었다. “파괴적 혁신은 산업은 물론 사회 전체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3가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혁신을 ‘파괴’가 아닌 ‘존속적인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라고 정의했다. 존속적인 혁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이 혁신은 경제 성장과 기술적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혁신이 존속적인 혁신에 속한다.
선두 기업은 경쟁제품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뛰어난 성능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개발·생산한다. 고객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업 경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혁신은 자사 제품, 기존 고객이라는 틀에서 맴돌 뿐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그는 파괴적 혁신에 성공한 기업으로 구글(Google)과 넷플릭스(Netflix)를 꼽았다. 구글은 광고주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구글 검색엔진)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광고 산업을 파괴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했고, 소프트웨어 시장도 새롭게 등장했다.
넷플릭스는 영화 대여 비즈니스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뤘다. 넷플리스는 광대역 인터넷을 활용해 집에서 영화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대형 비디오 대여업체인 블록버스터가 무너졌다. 그는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전통적인 비디오, DVD 대여 사업에 필요한 상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거했다”며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 혁신은 제품을 보다 간편하게, 싸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일부분이다. 보다 중요한 건 기존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넷플릭스의 인터넷 비디오 대여 사업 초기 이익률은 블록버스터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며 “선두기업이 파괴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익성이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파괴자의 초기 고객은 선두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한명이다. 앞서 언급한 비소비자다. 선두기업은 이들을 ‘매력적인’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서다. 이런 이유로 파괴자는 기존 시장 리더의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
‘퍼스트 무버’라는 성장모델 버려라

크리스텐슨 교수는 파괴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혁신의 속도를 재정립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이다. 한국 기업은 항상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빠른 추격자)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시장 선도자)로 성장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문제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후 한국 기업은 ‘빠르게 해야 뭔가 성과가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속도(speed)는 존속적인 혁신에만 적용된다. 파괴적 혁신은 기존 패러다임을 깨부수는 것이다. 이런 혁신은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속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 파괴적 혁신의 원칙은 자율성이다. 그는 “기업이 자율성을 가질 때 파괴적 혁신이 이뤄진다”고 역설했다.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괴적 혁신은 초기 낮은 이익률을 기록한다. 그래서 경영진은 기존 사업에 비해 적은 자원을 투자한다. 기업은 잘 나가는 사업을 유지·강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는 “(사업부별로)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며 “파괴적 혁신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해진 답이 아닌 ‘가능성 있는 답’을 찾아라. 그가 전한 마지막 원칙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성장 계획을 세웠다. 기존 방식으로 답을 찾도록 우리 스스로를 몰아붙인 것이다. 과거 데이터가 아닌 미래 주어진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는 “파괴적 혁신은 우리가 모르는 제품과 서비스, 비소비자를 타깃으로 할 때 실현된다”고 말했다.
▒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
1992년부터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1995년 파괴적 혁신 이론 발표. 교수로 임용되기 전 MIT 교수들과 함께 전자·통신 부품업체 설립, 회장 역임. 2000년대엔 컨설팅회사 설립 경영.
1971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모르몬교) 선교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