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그린카’. 회사명만 들어도 사업 전략 방향을 알 수 있다. 바로 친환경이다. 그린카는 157대의 전기차를 포함, 국내 카셰어링 업체 중 가장 많은 친환경 차량(585대)을 운영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 개선 효과도 크다. 공유 차량 1대를 운영하면, 일반 승용차 8.5대의 수요 감소 효과를 낸다. 공유 차량이 전기차라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6월 11일 김좌일(52) 그린카 대표를 만나 친환경 차량 운영 등 그린카의 성장 전략에 대해 들었다.
소비자들이 왜 카셰어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나.
“과거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매해 사용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렌털, 공유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구매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비자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가 더 많다.
젊은 세대일수록 차량 공유에 관심이 높다. 그들은 꼼꼼하게 가격과 용도를 따지며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자동차 구매, 사용 패턴도 마찬가지로 변했다. 소비자가 언제, 얼마나 차량을 이용하는지 보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출퇴근, 주말 나들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다. 차량 소유자의 평균 차량 사용 시간은 하루(24시간)의 10%, 2.4시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사용하고 싶을 때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카셰어링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GM은 카셰어링 업체 ‘메이븐’을 설립했고, 다임러(카투고)와 BMW(드라이브 나우)는 각 사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쳐 조인트 벤처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카셰어링은 렌털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렌털은 차량을 빌리는 기준이 최소 하루 단위라면, 카셰어링은 10분 단위로 쪼개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또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람을 통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렌털의 주요 고객이 40대 이상이라면, 카셰어링은 20~30대 젊은층이다.
친환경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1년 사업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수입차 카셰어링을 내세웠다. 국산차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마케팅도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2014년 7월 기아자동차의 ‘레이’ 전기차를 도입하면서 친환경 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도입하며 친환경 차량을 늘려 나갔다.
카셰어링은 소비자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환경 개선 효과도 크다. 공유 차량 1대를 운영하면, 일반 승용차 8.5대의 수요 감소 효과를 낸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운영하면 환경 개선 효과는 더 크다.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린카의 전기차를 이용한 고객 수는 약 8만명에 달한다. 주행 거리는 약 710만km로 지구를 180바퀴 돈 것과 같다. 동일한 기준으로 가솔린 차량을 주행한 것과 비교하면, 약 700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다.
현재 그린카는 전기차 157대를 포함,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 차량(585대)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차량 6000대의 약 10%다. 올해 친환경 차량을 650여대(전기차 180여대 포함)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환경 개선 효과보다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돈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이 비싼 만큼 사용 요금이 가솔린 차량보다 비싸지 않나.
“그렇지 않다. 전기차 사용 요금이 더 싸다. 우리의 사업 방향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해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고객이 가솔린 등 일반 차량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총금액은 기본 대여료에 실제 사용한 주행료를 더해 책정한다.
그린카의 기본 대여료는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차는 구매 가격이 비싸서 우리가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기본 대여료도 올라가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 고객이 전기차를 빌릴 때는 주행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 총금액을 낮췄다. 현재 전기차는 가솔린 차량보다 인기가 훨씬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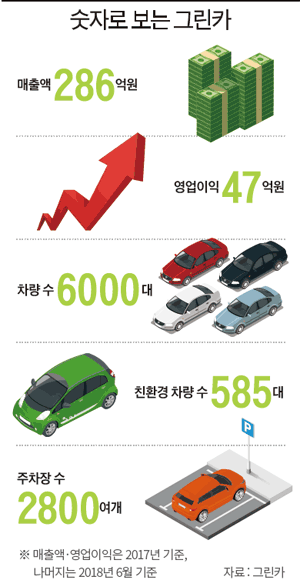
그린카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가솔린 차량인 현대차의 ‘아반떼’와 GM의 전기차 ‘볼트’를 4시간 대여해 100㎞를 주행했다고 가정해보자. 아반떼는 기본 대여료 1만7510원에, 보험료 2800원, 주행료 1만8000원을 더해 총비용이 3만8310원이다. 볼트는 기본 대여료 2만1880원에 보험료 2800원을 더해 총비용이 2만4680원이다. 볼트가 아반떼보다 1만3630원 싸다.
지난해 3월 그린카 대표로 취임했다. 어떤 부분에 경영 초점을 맞췄나.
“그동안 사업 규모를 키웠다면, 이제는 가동률을 높이는 등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총 60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났지만 정비가 되지 않은 차량도 있다. 이런 차량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고객이 10분 단위로 차량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만큼 관리 역시 매시간, 매분 단위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린카는 지난해 매출 286억원,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각각 23%, 124% 증가했다. 김좌일 대표는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린카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적으로 카셰어링 시장 규모는 지난해 360억달러(약 38조9000억원)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2000억달러(약 308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카셰어링 이후 카풀 형태인 라이딩 셰어링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규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카셰어링은 고객 한명에게 빌려주고 고객이 반납하면, 또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라이딩 셰어링은 한 명이 아닌 다수의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것으로, 목적지가 같은 방향이면 같이 타고 가는 형태다. 해외에선 이미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국내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카풀이 제한돼 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제가 완화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