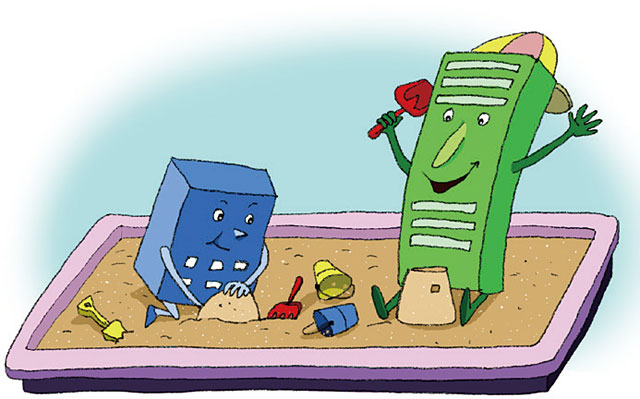
재계에 ‘서향(西向) 사옥은 불길하다’는 속설이 있다. 서향이 해가 지는 방향이라 풍수상 좋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의 대우그룹 몰락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서울 남영동에 사옥이 있던 모 그룹도 서향 사옥이라 외환 위기 당시 해체됐다는 말이 있었다. 서울 한복판의 한 대형 건물은 쉬쉬했지만, 터가 세서 일부러 관공서에 세를 줬다가 사옥으로 쓴다고 했다. 어지간한 대기업 사옥들은 풍수가들이 훈수를 두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 돌 지경이다.
최근 화제가 된 사옥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이다. 미국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 37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 앞에 3개의 큰 유리공을 나열해 놓은 듯한 돔형 사옥을 완공했다. ‘아마존 스피어(Amazon Sphere)’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세계 30개국에서 수집한 4만여 종의 식물로 가득하다. 이 사이로 회의실 등이 배치돼 있는데 나뭇가지 위 새 둥지처럼 생겼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시에 짓고 있는 신사옥은 ‘우주선(Space Ship)’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스티브 잡스가 숨지기 전 신축을 결정했는데, 타원형의 독특한 모양이라 이런 별명이 붙었다. 고액 연봉을 받는 2만여 명의 애플 직원들이 쿠퍼티노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모양이다.
국내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 초대형 신사옥이 단연 주목을 받는다. 10조5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에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지을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서울 잠실의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보다 14m 더 높은 569m에 달한다.
기업 사옥이 도시의 상징
기업의 본사가 자리잡은 도시들은 도시 이름보다 기업 이름으로 통한다. 시애틀은 아마존의 수도로 불리고, 쿠퍼티노는 ‘애플의 도시’로 더 유명하다. 도시를 널리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자리가 늘면서 도시의 경제력까지 높아진다. 시애틀을 보면 안다. 아마존 직원 4만명이 소비를 이끌고, 사옥 건설 등으로 호황을 맞았다. 시애틀의 중위소득(2015년 기준)은 8만349달러에 달할 정도다. 미국 전체 평균 1인당 국민소득(5만1722달러)보다 3만달러나 높다.
이렇다 보니 아마존이 계획하는 제2본사 유치 전쟁에 불꽃이 튈 지경이다. 미국과 캐나다 238개 지방정부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뉴욕·보스턴·시카고 등이 모두 포함됐다.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서는 도시는 5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50억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하는 셈이다. 후보 도시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뉴욕타임스(NYT)까지 끼어들 정도다. “애국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낙후된 도시들을 후보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내슈빌·볼티모어·디트로이트·세인트루이스 등을 추천했다.
이런 경쟁을 보면 기업의 본사와 사옥은 그 기업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상징, 대표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시애틀에 아마존 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본사가 있는 곳이 시애틀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거대 기업들이 그 도시의 성격과 색깔을 정하는 시대다. 그런 기업이 선택한 도시가 성장하고 해외 본사나 생산기지, 납품기지 등을 두는 나라가 성장한다. 국가나 도시가 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와 도시를 성장시키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 기업들도 한국에만 머물라는 법이 없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 이후 국내에 1곳의 공장도 신설하지 않았다. 강성 노조를 피해 해외 공장만 늘렸다.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아예 한국을 떠나겠다는 대기업이 생길지 모른다. 정부는 규제 풀어준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런 모래 놀이터쯤은 속전속결로 처리해줘야 기업들이 해외로 눈길을 주지 않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