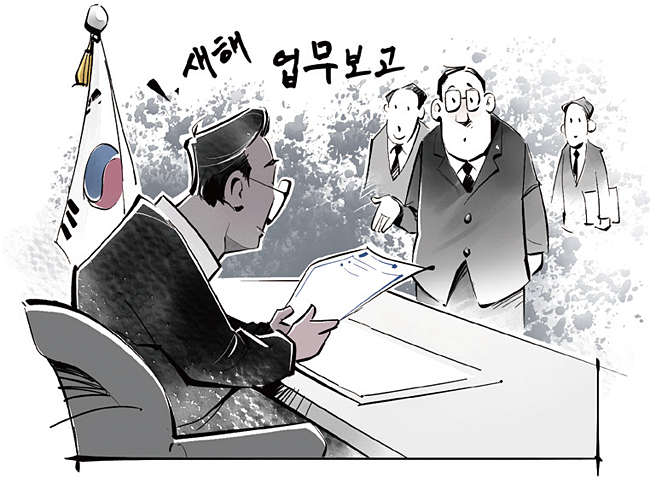
미국 대통령은 보통 1월 말~2월 초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해의 국정운영 방침을 담은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발표한다. “대통령은 때때로 연방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들에 대한 의회의 검토를 권고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90년 1월 8일 손으로 쓴 7쪽 분량의 문서를 의회에 보낸 게 연두교서의 첫 사례다. 이처럼 문서만 보내다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의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관행이 생겼다. 라디오 중계는 1922년 워런 하딩 대통령, TV 중계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처음 이뤄졌다.
연두교서는 당초 대통령과 의회의 소통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점차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원래 낮에 했던 연설을 1960년대부터 저녁 시간대에 하게 됐다. 지금은 TV 프라임타임에 맞춰 동부시간으로 밤 9시에 연설이 시작된다. 최대한 많은 국민이 대통령 연설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에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된 관행이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대신 ‘국정연설’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오전에 진행된다. 미국과 비교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10~11월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 기자회견의 모두연설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또 다른 관행이 있다. 정부 부처들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다. 많은 부처가 돌아가며 보고를 하다 보니 1월에 시작된 업무보고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로 인해 새해 들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정책을 보고하는 일도 벌어진다.
과거엔 대통령이 각 부처를 순시하며 보고를 받았다. 요즘엔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기능이 유사한 부처를 3~4개씩 묶어 민관합동 토론회로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5개 주제별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합동보고를 했다. 일정한 양식이 없는 것이다.
그때그때 형식이 바뀌고, 시기도 일정치 않은 것은 새해 업무보고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사실 새해 업무보고는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유산이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해 부처 간 조율·조정을 거친 새해 국정운영 방침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다. 연두교서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큰 틀을 밝힌 뒤 다시 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은 보기에 따라 시간 낭비에 가깝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다 챙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새해 업무보고를 재고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큰 파행을 빚었다. 기획재정부·국토부·외교부 등 11개 부처와 금융위·방통위 등 모두 20개 부처·기관이 3월 19일 하루에 무더기로 업무보고를 했다. 그것도 총리가 서면보고를 모아서 분야별로 요약한 뒤 대통령에게 대신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새해 업무보고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행사이기 때문이다. 재탕·삼탕, 짜깁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다. 대통령도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차제에 새해 업무보고를 폐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