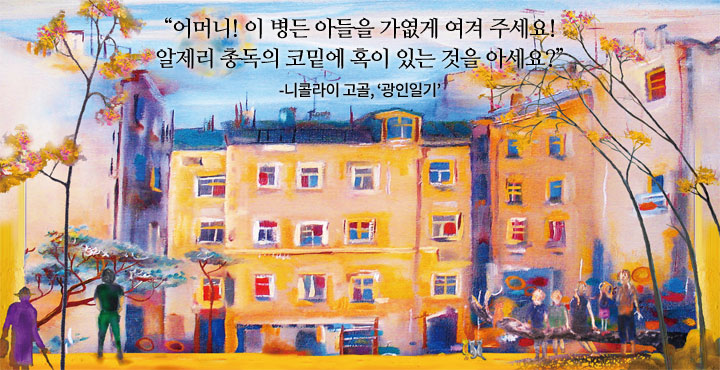
니콜라이 고골의 ‘광인일기’는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한 난감한 문장으로 끝난다. 솔직히 말하면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광기 그 자체다. 뜬금없이 알제리 총독의 코밑을 운운하는 상황은 결말로 치달으며 주인공을 향해 샘솟았던 일말의 연민에 재를 뿌린다. 병든 아들을 가엾게 여겨 달라고 애절하게 매달리는 주인공이 그리워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그뿐이다. 갑자기 앞의 이야기와 어느 한구석도 닮은 데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로 멀리뛰기 해 버리면서 물기 어렸던 마음에는 다시 전운이 감돈다. 느낌표와 말줄임표 그리고 물음표로 이어지는 광활한 비약의 상관관계 앞에서 아연해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역시 미쳤네. 확실히 미쳤어. ‘광인일기’는 독자의 연민을 바라지 않는다.
알제리 총독의 혹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느닷없이 등장한 혹 이야기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렇게 황망하게 소설을 마친 고골 자신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맥락 없이 존재하는 난감하고 뜬금없는 엔딩은 고골 그 자신의 삶과 똑 닮았기 때문이다.
정신착란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그의 언어도 자주, 실은 항상 이렇게 길을 잃었다 한다.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은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일시적 정지 상태가 된다. 꿈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있는 것도 아닌 진공의 존재가 된다. 이런 정지 상태가 일상이었던 삶이 견뎌야 했던 고통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광인일기’의 무질서한 기록들은 고통 속에서 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죽어 간 고골이 남긴 영혼의 발자국 같다.
‘광인일기’는 14등급으로 나뉘어 있던 러시아 관등 체계 아래에서 살아가던 하급 관리가 서서히 이상해지다 급기야 완전히 미쳐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국장 집 서재에서 거위털 펜을 깎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을 하는 그의 이름은 포프리시친이다.
그는 두 가지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 첫 번째 절망은 가진 재산이 없고 내보일 만한 가계도 역시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분 상승에 대한 희망이 없다. 두 번째 절망은 국장의 딸을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문제다. “자넨 땡전 한 푼 없잖나.” 사람들 눈에 그는 “마흔이 넘어 지혜도 없는 주제”에 국장 따님에게 지분거리는 주제 파악 못 하는 ‘노바디(nobody)’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골은 혼자 있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함께 있는 건 좋아했을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다고 한다. 혼자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거대하고 완벽한 그리고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시작한다.
현실에서 그는 아무도 아니지만 자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그는 누구든 될 수 있다. 공상의 시작이다. 그러나 공상이 본격화할수록 병증도 심해지는데, 그의 세상과 현실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는 식이다. 각하라 부르는 국장 앞에서 그는 자꾸 혀가 헛돌거나 혀가 꼬인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날씨가 춥다거나 따뜻하다거나 하는 것뿐이다. 다른 말은 절대 못 한다. 그가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상대는 네프스키 거리에서 들은 강아지 두 마리, 즉 멧쥐와 피젤이 나누는 대화가 유일하다. 그중에서도 멧쥐는 그가 좋아하는 국장 딸의 강아지인데, 국장과 국장 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두 마리의 개가 주고받은 편지를 읽는 장면에 이르면 그의 증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편지를 읽다 국장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큰 충격에 빠진다. “이 세상은 더 나을 것이 없다. 시종무관 아니면 장군이 모든 것을 차지한다.” 심화된 공상은 단계를 밟아가며 망상으로 나아간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그는 이제 자신을 동일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은 스페인 왕이다. “스페인의 왕이 살아 있었다. 그가 발견됐다. 그 왕은 바로 나다.” 광기의 삼단논법에 따라 그가 곧 스페인 왕이었음이 공표된다. 현실 세계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 그의 세계 안에서 하나둘씩 이루어진다. 그의 내부 세계에서 그가 느끼는 만족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부 세계와 그를 가로막는 벽은 높아진다. 망상에서 이어진 동일시는 비일상의 일상화를 고착시킨다. “여러분, 이제 나를 속이지 마시오. 그 더러운 서류를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세상. 평생을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포프리시친처럼 남들 눈엔 광인이어도 내 안에서 완벽하게 행복을 느끼는 삶이 있다고 하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을까. 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후자가 아닐 자신이 있을까. 1800년대를 살았던 고골이 내놓았던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앞에서 아연해지지 않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광인일기’는 어느 미친 인간의 무질서한 기록이 아니라 어느 미친 시대에 대한 정밀한 기록이다. 이 슬픈 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조금 슬플 뿐이다.
▒ 박혜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젊은평론가상
니콜라이 고골(Nikolai Gogol)
1809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소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고 학생 시절부터 시나 산문을 써서 잡지에 투고했다.
관리가 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 좌절한 뒤 가명으로 시집 ‘간츠 큐헬가르텐’을 출간했으나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한 데 절망해 스스로 불태웠다. 이후 고향 우크라이나 지방의 민담을 소재로 한 ‘디칸카 근처 마을의 야화’로 러시아 문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다. 특히 러시아의 관료 제도를 날카롭게 풍자한 희극 ‘검찰관’으로 문단의 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언론과 관리들의 비난으로 6년 동안 로마에 피신해 살았다. 이 기간에 봉건 러시아의 농노제와 부패한 관료들을 풍자한 최대 걸작이자 마지막 작품 ‘죽은 농노(죽은 혼)’를 집필한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만족스러운 작품을 쓰지 못한 채 보수주의와 극단적 신앙 생활에 빠져든다. 착란에 가까운 정신 상태로 단식에 들어가 1852년, 숨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