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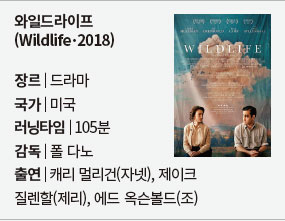
직장인들은 종종 폼나게 사표 던지는 꿈을 꾼다. 의견이 무시됐을 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친구의 연봉이 더 많고 동료의 승진이 더 빠르다는 걸 알았을 때,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을까, 이 회사 아니면 나 알아주는 데 없을까, 뛰쳐나가고 싶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밀고 올라오는 자존심을 삼킨다. 뒤늦게 꿈을 이뤄보겠다며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인생과 가정이 방향 없이 표류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는 본인보다 자신을 믿는 자식의 꿈, 가정의 안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슴을 펴고 상사와 고객을 호쾌하게 마주한다. 그렇게 또 한 번, 크게 번질 뻔했던 불씨를 끈다.
제리는 그러지 못했다. 매번 일자리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마다 조금 더 메마르고 점점 더 추운 북쪽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해야 했다. 캐나다 접경 지역인 몬태나까지 내몰린 그의 삶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 하지만 제리는 자존심을 끌어안고 또다시 일을 때려치운다.
바닥 없는 절망과 자괴감에 빠진 제리는 몇 달째 번지고 있는 인근 지역의 산불을 진화하겠다며 일용직 노동자가 돼 도망치듯 집을 떠나버린다. 남편의 재기를 믿으며 견뎌보려고 애쓰던 아내 자넷은 한계에 부딪히며 무너져간다.
반복되는 아버지의 실직과 구직, 이사와 전학이 아들 조에게 가르쳐준 것은 싫다고 말해도, 힘들다고 말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아이는 의견을 표현하는 대신 말없이 현실에 적응하는 데 익숙하다.
가난하지만 닭살 커플이던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빙긋 웃던 아이, 잦은 전학으로 친구가 없어 외롭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며 방과 후에는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할 정도로 속 깊은 아이지만 부모의 방황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조는 바람난 엄마 대신 장을 보고 식탁을 차리고, 아빠 대신 고장 난 변기를 고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조는 외톨이 전학생 신세를 견뎌야 하는 것 말고도 인생에는 다양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홀로 배우며 묵묵히 기다린다.
자신도 모르게 들이마셔야 하는 연기를 내뿜는 저 먼 산의 불길이 빨리 꺼지기를, 산불을 자연 진화시켜줄 첫눈이 어서 쏟아져 내리기를, 그래서 아빠가 돌아오기를, 그러면 엄마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모든 게 예전처럼 평화로워질 거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엄마 아니냐고, 아이 마음을 생각해보라고, 아들 좀 돌보라고 등짝을 패주고 싶다가도 서른네 살의 여자구나, 싶으면 이해 못 할 것도 없는 자넷. 그녀의 두려움은 조의 본능적인 불안과 달리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다.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배신감, 산불에 휩쓸려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장이 돌아올 때까지 이웃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아들과 단 둘이 지내야 한다는 고립감.
그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안고 조와 함께 산불 현장을 찾아간다. 제리를 만나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자신을 뒤덮어버린 혼란과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싶을 뿐이다. 우릴 팽개치고 네 아빠가 얼마나 허튼짓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그러니 너는 엄마의 일탈을 이해해야 한다고 아들 조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불이 나면 동물들은 어떻게 되죠?” 산으로 가던 길, 조가 묻는다. 어린 것들은 죽기도 한다고, 슬픈 일이지만 울어도 소용없다고, 그래도 다들 적응하며 살아갈 거라고 자넷은 무심하게 대답한다.
그 어린 동물들의 운명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조는 산을 무너뜨릴 듯 코앞에서 번져가는 불길을 보며 생각했을 것이다. 왜 작은 불꽃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자라서 세상 모든 것을 태워 없앨 기세로 타오르는 것일까. 불길은 우리 집을 다 태우고 있는데 아빠는 왜 저 먼 곳, 엉뚱한 어딘가에서 불을 끄겠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일까.
영화에서 조가 경험하는 문제는 사실 특별하지 않다. 세상 어떤 부모도 성인군자나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부부의 불화, 부모·자식 또는 형제간의 오해가 종종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다.
행복이란 풍랑이 가라앉은 바다 위에 내려앉은 햇빛의 반짝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조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사진관의 주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평생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단다.”
불길이 잡히고 첫눈이 내리면서 마침내 아빠가 돌아오지만, 예전과 같은 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조가 간직하고 싶은 것은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추억할 수 있는, 잠깐의 미소가 담긴 가족사진 한 장이다.
모든 어른이 쓰다듬고 싶은 소년 시절
‘와일드라이프’는 퓰리처상 수상 경력을 가진 미국 작가, 리처드 포드가 1990년에 발표한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미국 밴드 ‘비치 보이스’의 리더, 브라이언의 정신적 고통을 다룬 영화 ‘러브 앤 머시’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던 폴 다노가 2018년에 선보인 감독 데뷔작이다.
제이크 질렌할과 캐리 멀리건이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를 겪는 부모를 호연한다. 폴 다노를 꼭 닮은 것 같은 에드 옥슨볼드가 보여주는 조의 차분한 내면이 묘하게도 관객의 가슴을 쥐락펴락한다. 조는 어른들 모두의 자화상이다. 우리 모두 그 정도의 무게를 감당하며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숙한 관객이라면 조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지금 너를 할퀸 상처가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 아픔이 우리를 진짜 인간으로 성장시켜 주는 거라며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싶어진다. 그렇게 관객은 오래전 자신을, 조금은 외로웠고 조금은 힘들었지만, 무사히 건너온 그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 대견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보려 애를 써도 제리와 자넷처럼, 어떻게 꺼야 하는지 모르는 산불이 인생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날이 있다. 대개의 불씨는 쉽게 밟아 꺼버릴 수 있지만 어떤 불길은 애를 먹인다. 매운 연기가 폐를 가득 채워 기침을 토해내게도 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지독한 화상을 입히기도 한다. 오늘 껐다고 해서 내일 또다시 불길이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조가 화재 예방 수업에서 배운 대로 큰 산불은 덤불을 태우고 산을 정화한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소중한 많은 것을 잃는다고 해도 까맣게 불타버린 대지 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내밀고 올라오는 새싹들. 그렇게 또 오늘이 시작된다. 하지만 숲의 모양을 되찾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그러니 주의. 작은 불길 먼저 끄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김규나
조선일보·부산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소설 ‘트러스트미’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