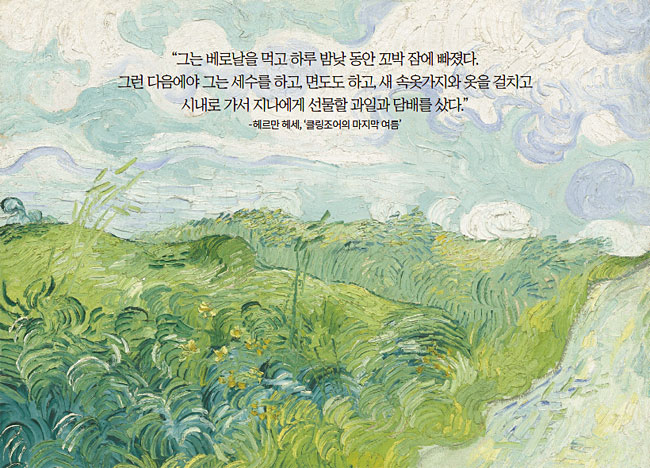
누군가 내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냐고 물을 때 한 번도 헤르만 헤세라고 답한 적이 없다. 고비에 봉착할 때마다 헤세의 작품을 읽으며 결정적인 통찰을 얻었고 사람에게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진실한 위로를 받았으면서도 헤세를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하지 않는 건 사실 좀 이상한 일인 것 같다. 모두가 좋아하지만 누구도 ‘가장’ 좋아하지 않는 작가, 이른바 ‘국민작가’나 ‘대문호’의 비애일 테다. 헤세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열다섯 살에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으면서부터였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전에 알았던 세계는 산산조각난 거나 다름없게 됐다. 불쌍한 한스. 가여운 한스. 착한 아들이자 흠잡을 데 없는 모범생이었던 한스는 누가 봐도 전도유망한 소년이었으나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 규율과 영혼을 잠식하는 통제 안에서 점점 불행해지더니 내내 달고 살던 두통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한스에게 이입해서 소설을 읽던 내가 그의 죽음이라는, 불행하고 허무한 결말 앞에서 경험했던 당황스러움은 말 그대로 형용이 불가하다. 한스의 삶이란 것이 당시 나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다. 어쨌거나 정답을 많이 맞히는 모범생으로 살면 인생이란 시험에서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내 신념은 한스의 삶을 목격한 이후 더는 유효하지 않은 가짜가 됐다. 수레바퀴 아래 깔리지 않으려면 수레바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해 주는 어른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내게는 헤세만이 어른이었다.
내 바닥과 마주하기 위해 ‘싯다르타’를 읽었던 걸까. 스물다섯 살에 ‘싯다르타’를 읽으며 엉엉 울었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취업 시장에서 ‘내가 이 일에 더 적합한 이유’ 따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내가 하게 될 일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대한 모순이다.- 타인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일 때 ‘싯다르타’의 문장을 읽으며 내 진짜 얼굴을 잊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내 생을 통틀어 가장 행운 가득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바로 자아로부터 빠져나오려 하였던 것이며, 바로 그 자아를 나는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고, 그것을 단지 기만할 수 있었을 뿐이고, 그것으로부터 단지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며, 그것에 맞서지 못하고 단지 몸을 숨길 수 있을 따름이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유난 떨지 말라고, 어차피 면접관들도 네가 하는 말이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헤세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신을 관찰하라고 조언해 주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역시, 사람은 죽어야만 어른이 되는 걸까. 어른으로 죽은 사람만 기억되는 거겠지.
그리고 지금. 서른다섯 살의 나. 권태, 혹은 방향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내 손에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이 들려 있다. 고흐의 마지막 순간을 연상시키는 이 소설은 주인공 클링조어가 한숨 푹 자고 난 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한 후 갈아입은 속옷 위로 옷을 입은 다음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해 줄 선물을 사러 시내로 나가는 장면에서 끝난다. 마흔두 살의 화가 클링조어가 생애 마지막 여름을 보낸 이야기를 꺼내 놓겠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의 머리말을 떠올려 보면, 이 작품은 확실히 죽음에서 시작해 죽음 이후,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 부활, 재생… 이른바 통틀어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엔딩을 취하고 있다. 모든 상황이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되는 리셋 개념과는 다르다.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은 몰락이다. 몰락함으로써 소멸하고 소멸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다시 시작되는 리셋, 요컨대 게임적 상상력과는 구분되는 현실적이고도 사실적인 상상력이자 방법론이다. 우리는 이따금 몰락을 통해 소멸에 이른 다음에야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엔딩
“왜 항상 바보 같은 연속만 있고, 들끓어 오르는, 충족된 ‘동시(同時)’는 없는 것일까” 편집자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학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적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일 테다.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나는 그와 같은 ‘성과’를 쌓기 위해 옆도 뒤도 안 보고 맹목적으로 질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선 ‘성과’가 남겨 놓은 자극을 또 한 번 맛보고 싶어 하는 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실패일 수밖에 없다. 알면서도 과거의 영화에 집착하고 있을 때, 10년 만에 나타난 헤세의 소설은 ‘바보 같은 연속’에 목매지 말고 돌아가는 수레바퀴에 붙들려 있지도 말고 ‘들끓어 오르는’ 동시를 상상하라고 따끔하게 조언하는 것 같다. 하고 싶은 것들이 열 가지도 넘던 시절, 한 개의 길을 만드느라 묻어 두었던 아홉 개의 길을 떠올리며 다시 태어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래, 소멸해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 끝에 새로운 탄생이 있으니.
▒ 박혜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젊은평론가상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년 독일 남부 칼브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시인이 되고자 수도원 학교에서 도망친 뒤 시계 공장과 서점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했으며 열다섯 살에 자살을 기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십대 초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 ‘페터 카멘친트’ ‘수레바퀴 아래서’ ‘인도에서’ ‘크눌프’ 등을 발표했다. 스위스로 이사한 1919년을 전후로 개인적인 삶에서 크나큰 위기를 겪고 이로 인해 그의 작품 세계도 전환점을 맞이한다. 술과 여인, 그림을 사랑한 어느 열정적인 화가의 마지막 여름을 그린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과 ‘데미안’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들과 더불어 ‘내면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기 시작한 헤세는 이 무렵 그림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그림은 음악과 더불어 헤세 평생의 동반자가 됐다. 이외에도 ‘싯다르타’ ‘황야의 이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동방순례’ ‘유리알 유희’ 등 세계적인 작품들을 발표했고 1946년 ‘유리알 유희’가 결정적 계기가 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1962년 8월, 제2의 고향인 스위스에서 잠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