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에 내리는 눈은 좀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 3월에 눈 내리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내린다 해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탓이다. 하지만 내게는 좀 다른 생각이 있다. 3월의 눈을 알아채지 못하는 건 그 한순간 내리는 눈을 부를 언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겨울과 이별하고 봄을 기다리는 시간에 흩날리는 눈은 겨울의 눈도 아니고 봄의 눈도 아니다. 그러면서 겨울의 눈이기도 하고 봄의 눈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우린 알지 못한다.
‘3월의 눈’은 80대 중반의 노인이자 부부인 장오와 이순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희곡이다. 3월 중순 어느 날 아침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하루 동안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장오와 이순의 일상적인 대화들이다. 이발하러 갔던 장오가 나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걸 보고 이순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이발소가 없어졌다고 대답하는 장오의 표정에 힘이 없다. 이발소라고는 이 동네에 그거 하나뿐인데 하나 남은 이발소마저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만둣집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며 땅값이 올라 세를 감당 못 한 사람들이 죄다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 마음이 들지 않던 차다. 그렇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올 주변머리도 없었던 장오는 심란하기만 하다.
장오와 달리 이순은 50년 전 이 동네에 이발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사람들 머리를 깎아 주던 이발소 김씨를 추억하기도 하고 장오를 위한 옷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뜨개질을 하기도 한다. 봄이 왔으니 문에 창호지를 새로 바르자며 시큰둥한 장오를 창호지 사러 내보내기도 하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준칫국을 먹었던 어느 날을 떠올리며 서로의 기억이 틀렸다고 타박을 주기도 한다. 그 모습이 활짝 핀 꽃처럼 평온하고 따뜻하다.
동시에 벌어지는 또 다른 일은 두 사람의 소박하고 다정한 일상과 대조된다. 장오와 이순의 대화가 순한 볕을 닮았다면 다른 이 장면은 퉁명스러운 잿빛의 기운을 띤다. 장오와 이순의 집을 해체하기 위해 찾아온 인부들이 대들보며 문틀을 뜯어낸다. 대패로 일일이 밀어 골을 잡은 것만 봐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어진 집인지 알 수 있는 집이 부서져 간다. 이제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겠지. ‘진짜배기 한옥’이 뜯겨 나가는 과정은 서글프고 애처롭다.
장오는 이 집을 팔았다. 좌익 운동한다고 나가서 생사도 알 수 없게 된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막다른 길에 몰린 걸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장오는 그들의 사업 밑천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집을 팔고 자신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선택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간다. 장오와 이순의 따뜻한 대화는 이순이 살아 있던 과거에 대한 장오의 회상과 상상이었다는 게 드러난다. 이순과 함께한 장오의 과거에는 많은 색깔이 있었다. 그러나 장오의 현재는 담담한 무채색이다.
집은 안식처다. 부박하고 나약한 인간에게는 마음의 집이 필요하고 몸을 뉠 집도 필요하다. 마음의 집이었던 배우자는 세상을 떠났고 그와의 기억에 기대 몸을 의탁했던 집도 부서지고 있으니 장오는 자신의 삶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한 몸 온전히 뉠 곳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끝의 형식으로 충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장오도 그 형식에 따라 조용히 사라지려 한다. 누구의 배웅도 받지 않고 혼자 요양원으로 향하는 것으로. “다 끝났어. 끝은 끝이야. 세상에 좋은 끝은 없어. (중략) 제일 추접스러운 게 사람의 끝이야. 볼 필요도 없고 보여 줄 필요도 없어.”
그러나 ‘3월의 눈’은 끝에도 의미가 있다고, 사라지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해의 마지막 눈. 금방 소멸하고 말 가벼운 눈은 한 계절의 추억과 한 해의 기억과 도래할 봄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 속에 담고 있다. 가볍다고도 무겁다고도 할 수 없는 생의 무게가 3월의 눈으로 내린다. 우리 인생이 사라져 가는 순간이 꼭 이렇게 3월의 눈과 같을 것 같다. 겨울의 기억을 품은 채 봄처럼 피어나는 눈은 고단하게 살아온 한 생애의 끝이 지니는 공허의 무게에 대한 비유이자 존재의 무게에 대한 반어가 아닐까.
“그가 떠난 자리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남아 있다”
장오의 말처럼 세상에 좋은 소멸은 없다. 그렇다 해도 그 소멸마저 살아내는 것이 인간이고, 그런 존재는 대견하다.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며 생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 한 남자는 머지않아 사라질 테지만 그가 떠난 자리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남아 있다.
3월에 내리는 눈은 인간이 세상에 남긴 사랑의 무게이고 형태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볼 필요도 없고 보여 줄 필요도 없는 끝이 조금은 기다려진다. 나는 이제 3월의 꽃보다 3월의 눈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 박혜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젊은 평론가상
배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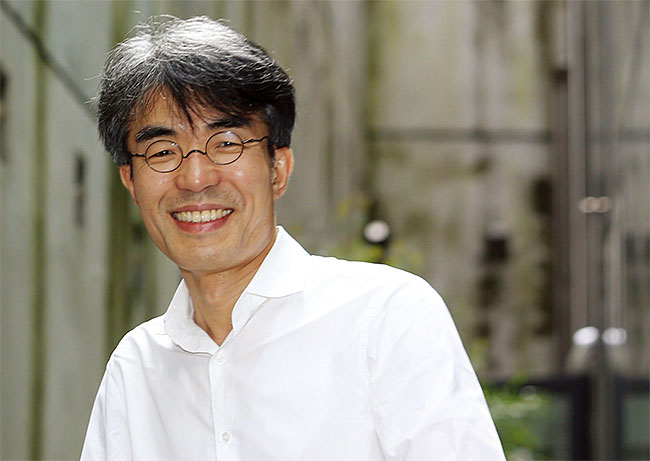
1970년 전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전문사 과정을 마쳤다. 1998년 ‘하얀 동그라미’로 데뷔했다. 2003년 극단 미추의 전속 작가이자 대표 작가로 활동하며 ‘삼국지’ ‘마포황부자’ ‘쾌걸 박씨’ 등의 마당극과 뮤지컬 ‘정글 이야기’ ‘허삼관 매혈기(각색)’를 비롯해 ‘최승희’ ‘벽 속의 요정(각색)’ ‘열하일기만보’ ‘거트루드’ ‘은세계’ 등 다수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후 ‘3월의 눈’ ‘먼 데서 오는 여자’ 등 왕성하게 작품을 선보이며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극작가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열하일기만보’로 대산문학상과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2008년 ‘거트루드’로 김상열연극상을, 2009년 ‘하얀 앵두’로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2015년 ‘먼 데서 오는 여자’로 차범석희곡상을, 2017년 ‘1945’로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올해의 작품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