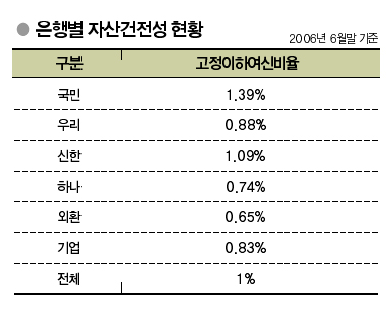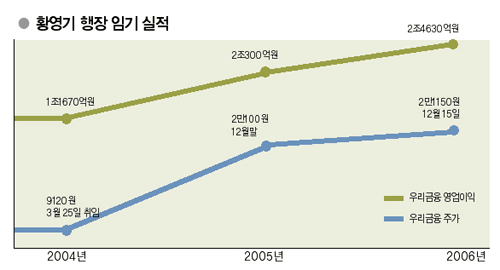삼성그룹의 핵심 엘리트였던 황 행장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을 선택했던 2004년 3월, 금융권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스스로 삼성이라는 탄탄대로를 벗어나 가시밭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황 행장은 국내외 자본시장(투자은행) 경험은 많았지만 은행 실무 경험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과연 부실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거대한 관료주의적인 조직(은행)을 경영할 수 있겠는가’하는 우려가 컸다.
이에 우리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과연 잘 경영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이슈였죠. 은행 특성상 업무 경험과 함께 관료주의적인 조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엘리트 코스만 경험한 사람이 이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성장성·건전성 등 경영 성적표 올 'A'
그렇게 3년여가 지난 지금 황 행장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졌다. 재임기간 동안의 경영 성적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황 행장은 회사의 성장성, 건전성, 수익성, 주가 등 기본적인 경영 평가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황 행장 취임 첫해였던 2004년 우리금융은 전년 대비 무려 300%가량 증가한 1조1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 2005년에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2조300억원을 올렸고, 2006년에도 전년 대비 21% 증가한 2조4630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영업이익이 매년 껑충 뛰면서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었다. 2003년 560억원에 불과했던 당기순이익은 이듬해 1조원(1조2920억원)을 훌쩍 넘겼고, 2005년에는 1조6880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에는 2조12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장사를 잘해 이윤을 많이 남긴 셈이다.
이익이 대폭 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다. 황 행장 취임 당시 912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2006년 12월11일 현재 20800원으로 20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전액(11조4200억원) 회수는 물론 대규모 추가 이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77.9%(6억2788만 주). 이를 투입 금액 대비 주식으로 환산하면 주당 1만4168원이다. 여기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금융비용(이자)까지 포함하면 적정가격은 주당 1만78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즉 우리금융 주가가 1만7800원만 넘으면 공적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우리금융의 현 주가를 감안하면 정부는 지금 당장 보유지분을 팔아도 공적자금은 물론 1조2000억원가량의 추가 이익도 챙길 수 있다.
한정태 미래에셋증권 금융담당 애널리스트는 “지난 3년간을 보면 우리은행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다”며 “순이익이 대폭 늘어난 데에는 출자 주식 매각, 우호적인 시장 상황 등 영업 외적인 요인들도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행장의 경영 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운칠기삼 아닌 기칠운삼”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의 이 같은 영업실적이 황 행장의 경영 능력보다는 우호적인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즉 ‘때를 잘 만난 것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자산성장성과 건전성을 보면 단순히 ‘운’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2003년 7월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우리금융은 자산(연결자산, 금융채권 제외) 규모가 부동의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2위 회복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과 조흥은행의 합병으로 자산 규모가 무려 10조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 하지만 우리금융은 지난 2005년 9월, 2위 탈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취임 첫날부터 ‘금융대전과 공격경영’을 선언한 황 행장이 자산을 매년 20조원 이상씩 늘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금융은 2006년에만 자산이 무려 35조원가량 늘었다.
금융지주회사의 주력인 은행 간 비교에서도 우리은행의 성장은 단연 돋보인다. 신한+조흥은행에 밀려 은행 총자산(신탁계정 및 상호거래 포함)이 3위로 밀려났지만 2006년 상반기 신한은행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2위를 차지했다. 2006년 9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총자산은 175조4000억원이며, 신한은행(조흥은행 포함)은 175조2000억원이다.
우리금융의 자산 급성장과 관련, 류재철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M&A를 통해서 일거에 성장한 반면 우리금융은 자체 노력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단순히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라면 여타 은행들도 비슷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금융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CEO의 경영 능력 등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은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했지만 건전성 면에서도 여타 경쟁 은행을 압도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8%. 이에 반해 경쟁 은행인 국민, 신한은행은 각각 1.39%, 1.09%로 업계 평균인 1%를 넘고 있다. 흔히 성장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다. 황 행장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살아있는 시체에 활력을 불어 넣다”
최근 우리금융은 경영 실적과 함께 조직의 체질도 많이 개선, 강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여타 기관들과는 달리 조직 내 활기가 넘친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다. 사실 황 행장 부임 초기, 우리금융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 조직 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직원들의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황 행장이 새로운 성과급여제도와 신인사 시스템을 들고 나오면서 노사 간 대립도 끊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A지점 과장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직원들은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불신이 컸고, 일할 분위기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내 최고의 커머셜뱅크로 자부심은 있었지만 사실 죽어있는 시체와도 같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황 행장은 이 같은 우리금융의 느슨한 신경에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를 위해 ‘지면 죽는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를 두고 검투사 CEO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지점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솔개 넥타이를 전해주는 등 조직의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데 집중했다. 황 행장이 우리금융의 환골탈태를 강조하기 위해 만든 솔개 넥타이는 은행 내부에서 공격 경영의 증표로 여겨지고 있다. 황 행장은 “솔개가 40살이 될 때 무뎌진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쪼아 없애면 이후 새 부리가 생겨 70살까지 장수하지만 이 고통스런 갱생 과정을 포기할 경우 사냥감을 잡을 수 없어 결국 죽게 된다”며 임직원의 정신무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또 조직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외부와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하게 우리금융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사이에서는 그를 검투사가 아닌 ‘싸움닭’에 비유하기까지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은행 사명(社名) 소송과 토종은행 분쟁이다. 2005년 초 신한은행 등은 우리은행의 사명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걸었다. 이에 황 행장은 공개적으로 “등에 칼을 대면 우리도 뒤통수를 치겠다”고 말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또 하나은행이 황 행장의 토종은행론에 대해 반격하자 하나은행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황 행장의 이 같은 돌발 발언과 공격적인 대응에 일부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자기 은행만 안다. 행장 체면도 없느냐”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오히려 자극제가 되고 있다.
우리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이라는 특성상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다”며 “때문에 직원 사기 등을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대응이 최선책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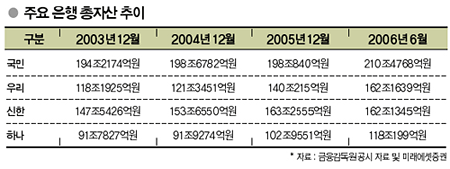
“할 말은 한다”… 대주주 예보와도 충돌
황영기 행장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와의 ‘충돌’도 피하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성과급 지급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는 2006년 10월 우수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예보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미 3월에도 그는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던 적이 있다.
황 행장이 경고가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성과급을 지급한 이유는 우수 인재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조직의 경쟁력도 사라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보로부터 경고 조치가 결정되던 날, 그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한국 국적의 금융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에 인재가 없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능력별로 차별화하지 못하고 있는 급여 평등주의 때문이다”며 대주주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황 행장과 예보와의 경영상의 이견과 충돌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은 예보의 반대로 올 상반기 LG카드와 외환은행 인수 등 M&A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당시 황 행장은 임직원들에게 “우리는 큰 기회를 잃었다”며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자”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우리금융은 예보와 맺은 MOU(경영이행각서)로 인해 각종 경영 계획이 수정 또는 변경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영업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다”며 “우리금융은 이미 오래전에 부실에서 벗어난 우량 회사인데도 예보가 주인이라는 이유로 고객들이나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황 행장은 끝내 참지 못하고 최근 공개적으로 예보의 경영 간섭과 MOU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2006년 12월 월례조회에서 예보의 MOU와 관련 “우리금융 매각(민영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민영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내 은행 산업과 우리은행 직원들을 모욕하는 수준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은행이 MOU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부실 금융, 정상화 필요성 등 3가지가 전제돼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부실 금융과 정상화 필요성이 없는 우량은행으로 거듭난 만큼 MOU 졸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