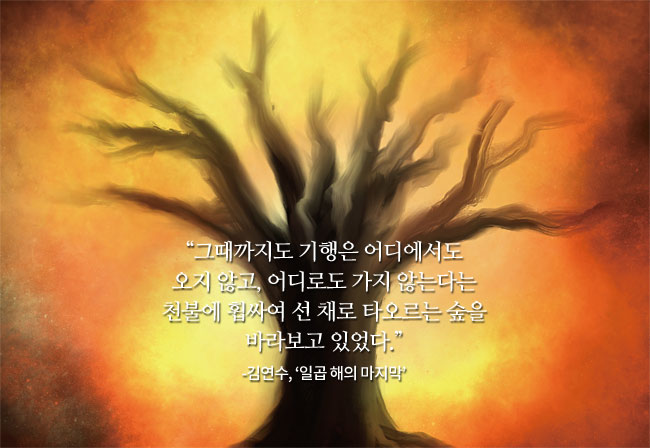
김연수의 아름다운 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은 경이로운 눈으로 천불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끝난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할 때 그 천불이 맞다. 어릴 적 나도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속에 천불이 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다.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오만 가지 기술이 다 나와도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만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안 나왔으면 좋겠다. 까맣게 타들어 갔을 엄마 속을 보는 건 너무 슬픈 일일 테니까. 아는 게 힘이고 권력인 세상이지만 모르는 게 더 나은 것도 있다. 가까운 사람의 아픈 역사는 희미하게 짐작만 하고 싶다. 고통을 나눈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나눌 수 없는 고통은 차라리 모르고 싶은 내가 덜 자란 이기주의자라는 비난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길을 잃는다. 천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가자면, 천불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았다. 단순히 불을 강조하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불은 하늘이 내린 불을 의미한다. 화전민들이 개간하기 위해 피우는 불을 지불이라고 하는데, 지불은 땅속뿌리로 타들어 가 100일이 넘도록 하얀 연기를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불이다. 천불은 지불과 정반대다. 말하자면 무의미, 무목적, 무제한. 저절로 생겨나 숲 전체를 시커먼 숯으로 만들어 버리는 천불은 인간을 향한 자연의 징벌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화전민들은 천불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화전민들이 느낀 것은 공포나 분노가 아니라 생에 대한 경외감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불을 보며 “생을 향한 어떤 뜨거움을, 어떤 느꺼움을 느낀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 주는 이 소설의 엔딩을 완전한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엔딩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존재의 죽음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천불이 나는 데에도 이유가 없다.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압도적 불길은 기존의 세계를 집어삼킨다. 한 세계가 사라지면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태어날 것이다. 죽음과 탄생의 반복은 비밀스러운 인생이 인간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힌트다.
‘일곱 해의 마지막’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등 너무 토속적이어서 오히려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서정시를 쓴 백석의 알려지지 않은 7년에 대한 이야기다. 백석은 서른 살도 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 시인으로 입지를 굳힌다. 그러나 백석은 당으로부터 혁명에 반하는 순수문학에 빠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적 예술가로 찍힌다. 그야말로 당의 눈 밖에 난 백석은 일찍이 가 본 적도 없는 삼수로 쫓겨난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땅에 떨어진 백석은 시를 쓰던 손으로 양을 친다. 알려지지 않은 7년이란 백석이 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이자 그의 마지막 시이기도 한 ‘석탄이 하는 말’을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7년을 역산한 시간을 말한다. 그 시간에 백석은 쓰지 않았다. 이 소설은 쓰지 않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쓰지 않을 수 있는 용기란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세상에서 시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외부의 힘에 의해 더이상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가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그야말로 뻔하다. 그 시절의 분위기에 맞는 글, 당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글, 목적과 의미로 가득한 제한적인 글. 요컨대 모든 점에서 천불과 상반되는 글. 원하지 않는 글을 쓰는 것보다 쓰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일은 어렵고 고귀하다.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떤 시를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무엇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은 무엇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었다.”
하지 않는 것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선의 반항이다.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선택이야말로 ‘완전한 자유’ 의지다. 그러므로 쓰지 않았던 백석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다. 천불이 나고 모든 것이 재로 바뀌는 소멸의 시간이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비하듯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무위의 시간은 차라리 새로운 ‘나’를 준비하는 들끓는 생성의 시간이다. 천불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 본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탄생할 수 있을까. 두려운 게 있다면 죽음과 탄생이 반복되지 않는, 죽지도 태어나지도 않는 삶일 뿐이다.
▒ 박혜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젊은평론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