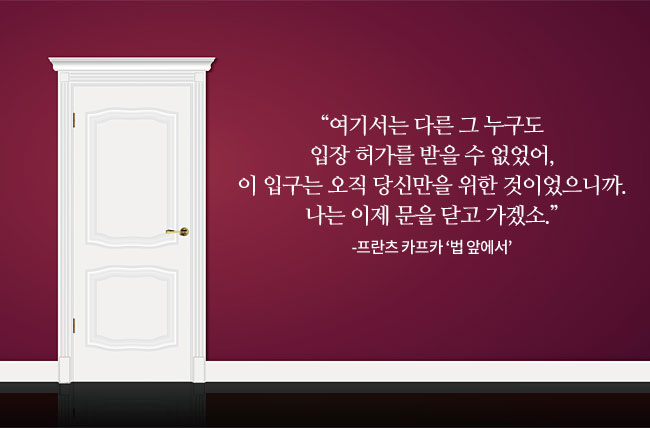
‘법 앞에서’는 짧은 소설이다. 소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카프카의 짧은 소설을 읽어 보면 된다.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으며 해결되지 않음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아이러니는 모순이나 부조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니 아이러니가 별것 아닌 일상적이고 평범한 개념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이러니를 인식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아이러니는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결과가 전체 안에서 과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모순이나 부조화를 설명하기 위해 좋은 예시가 바로 이 짧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있다. 순식간에 읽을 수 있지만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읽고 또 읽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작품이다. 내용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시골 남자가 법 앞에 도착한다. 그런데 문지기 한 명이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문지기가 말하길 언젠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 족쇄가 되어 남자는 ‘언젠가’를 기다리는 데에 ‘지금’을 바친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의 순간, 그러니까 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에서다. 남자의 기다림은 늙어 기력이 쇠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사이 남자가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한 건 아니다. 문지기를 매수하기 위해 갖고 있던 좋은 것을 모두 내어 보기도 한 그였다. 덥석덥석 받아 주는 문지기를 얼마나 집요하게 관찰했으면 외투 깃 속에 있는 벼룩까지 알아보게 될 지경이다. 쓸데없이 벼룩까지 알아보게 되는 동안 그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되어 몸이 굳어 간다. 어쩌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남자는 문지기에게 묻는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어째서 자신 말고는 아무도 들여보내 달라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한다. “여기서는 다른 그 누구도 입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 입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지기의 마지막 대사를 해석하는 글들을 출력해 쌓으면 방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철학자, 작가, 독자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소설의 엔딩을 놓고 아이러니의 본질을 규명하려 애썼다. 여기서 그 애쓴 흔적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법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형식적 조건이 다 있지만 그 조건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고 불가능한 일을 해낸 문지기의 업무 성과 능력에 대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요즘의 나는 문지기가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한다. 오직 그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서서 끝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니. 문지기는 내가 아는 모든 소설 속 캐릭터 중에서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거대한 힘을 행사하는 존재다. 그는 시골 남자로 하여금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죄와 고통, 희망 그리고 진정한 길에 대한 성찰”이란 글에서 카프카는 이 소설의 핵심을 찌르는 것과도 같은 글을 남겼다. “너는 세상의 외로움으로부터 뒤로 물러날 수 있다. 그건 네 마음이고 네 본성에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이러한 물러섬이, 네가 피할 수도 있었을 단 하나의 괴로움일 것이다.”
시골 남자는 문지기의 말을 무시한 채 진입을 강행하지 못했고 문지기의 말을 받아들여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물러섰다.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물러섬이 아니라,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다른 상황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물러섬이다. 물러선 결과 법 앞에 서서 법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된 그는 자기 인생의 죄인이다. ‘인간적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B(birth)와 D(death) 사이에 C(choice)가 있다고 말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길에 무수한 선택이 있으며 그 선택만이 우리를 보편 인간과 구분되는 단 하나의 실존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기다림도 선택일 수 있지만 자발적 기다림과 구분되는 종속적 기다림은 선택이 아닌 물러섬이다. 그는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탕진한 대가로,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고 선택당하길 기다린 대가로, 말하자면 인간적 죄악의 대가로, ‘법’이 무엇인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길이었는데도 말이다. 시골 남자의 기다림에서 자기 삶으로부터도 소외되어 버린 무력한 인간의 자화상을 읽는다.
▒ 박혜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젊은평론가상
프란츠 카프카
유대계 독일 작가로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1901년 프라하대학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탓에 긴 소설은 쓸 수 없었다고 하나, 머릿속에서 작품을 구상했다가 그것이 무르익으면 한꺼번에 써 내려가는 것이 카프카가 글을 쓰는 방식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1912년엔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선고’를 완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신’을 탈고했다. 1914년 완성한 ‘유형지에서’는 그의 작품 중 형식적으로 가장 잘 정돈돼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가 일관되게 천착한 주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소외와 허무다.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추구한 실존주의 소설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력한 인물들, 그들에게 닥치는 당혹스러운 사건들을 통해 20세기를 살아가던 인간 군상의 불안을 암시하는 상징주의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는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카프카적’인 것이라고 한다. 1917년에 이미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1922년 ‘성’을 완성했다. 1924년 폐결핵과 후두결핵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