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 당신은 노예제도가 19세기에 없어졌을 것이라 상상할 것이다. 1817년 이래 10개가 넘는 국제 협약이 맺어져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예가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5시간 안에 노예 한 명을 사고 싶다면 움직여라. 먼저 택시를 잡아타고 JFK 국제공항으로 가서 아이티 포르토프랭스로 가는 직행편 비행기를 타라. 3시간 뒤 투생 루베르튀(Toussaint L’Ouverture)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탑탑(tap tap)이라는 구형 트럭에 의자와 지붕을 장착한 포르토프랭스의 대중교통수단을 50센트에 탈 수 있다. 수도의 번화가인 루트 드 델마(Route de Delmas)를 향해 4분의 3쯤 가면 지붕을 벗기고 내려라. 길옆에 르 레소(Le R?seau: 네트워크)라는 이발소가 있고 그 앞에 사내 몇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다가가면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와 물을 것이다.
“사람을 구합니까?”
베나빌 레봄(Benavil Lebhom)을 만나라. 씩 웃을 것이다. 구레나룻을 잘 다듬고, 색깔이 화려한 골프셔츠를 입었으며, 금줄을 두르고, 짝퉁 독 마르텐(Doc Martens) 부츠를 신었다. 베나빌은 이른바 브로커다. 그는 공인 부동산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고용 대리인이라 부른다. 그가 중개하는 고용인의 3분의 2는 어린아이 노예다. 아이티 어린아이 가운데 노예 상태로 속박되어 있는 아이는 30만 명에 이른다. 크레올 말로 완곡하게 표현하면, 레스타벡(restav?ks: 머무르는 사람)이다. 강제로 붙들려, 아무 보수도 없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한다. 베나빌을 비롯한 수천 명의 공식 비공식 인신매매꾼은 가난에 찌들려 자포자기 상태인 시골 부모에게서 학교를 보내주겠다며, 잘 먹여 주겠다며 아이들을 꾀어낸다.
어린아이 노예를 사기 위한 흥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어린아이 한 명 데려가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청소하고 요리할 수 있는 아이로. 내가 사는 집은 작은 아파트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빨리 데려갈 수 있을까요?”
베나빌이 대답한다.
“3일이면 됩니다.”
당신이 묻는다.
“어린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니면 벌써 와 있나요?”
베나빌은 이 외국 손님의 말에 눈이 커진다.
“지금 포르토프랭스에는 없습니다. 시골에 가서 데려와야 해요.”
당신은 추가 비용에 대해 묻는다.
“교통비도 내가 지불해야 합니까?”
베나빌은 말한다.
“물론, 미화 100달러입니다.”
바가지를 쓴다는 기분이 들어 당신은 그를 다그친다.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베나빌은 대답한다.
“교통비는 당신이 직접 데려가야 하므로 100아이티화폐(약 13달러) 정도이고, 거기에 호텔, 식사비로 500구르드(gourde)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말한다.
“좋습니다. 500아이티화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할 차례다.
“소개비는?”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으나 베나빌은 당신에게 얼마나 뜯어낼까 생각하느라 눈이 가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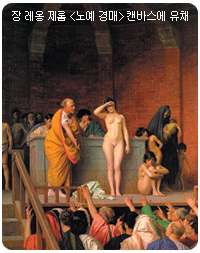
“미국인에게는 100달러.”
당신은 흥정을 깨뜨리지 않을 듯한 미소를 띤다.
“꽤 비싸군요. 아이티 사람에게는 얼마 받나요?”
베나빌의 목소리는 화난 것처럼 높아진다.
“100달러….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의 태도는 굳건하다.
“50달러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베나빌은 잠시 말을 멈춘다. 그건 연극이고, 그는 당신에게 충분히 뜯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좋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걸로 거래가 끝난 건 아니다. 베나빌은 몸을 기대온다.
“좀 미묘한 문젠데, 당신은 그저 일하는 사람만 필요한가요? 파트너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섹스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고 당신은 눈을 깜박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둘 다 가능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죠?”
베나빌은 기뻐서 대답한다.
“맞아요.”
만일 당신이 산 물건을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고 싶다면, 베나빌은 당신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처럼 필요한 서류를 꾸며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는 13세 소녀를 제안하고, 당신은 대꾸한다.
“좀 나이가 많군요.”
그는 대답한다.
“12살짜리도 있어요. 아니면 10살? 11살?”
흥정은 끝나고, 당신은 베나빌에게 별도의 말이 없으면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미국에서 600마일, 맨해튼에서 5시간 거리인 이곳에서 당신은 겨우 50달러에 아이 한 명을 성공적으로 사들인 것이다.
잔인한 진실
이 대화가 어떤 여행기처럼 꾸민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 기록은 2005년 10월6일, 4년에 걸친 5대륙 노예 실태 조사의 일부로 내가 쓴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예’란 부당한 학대에 대한 은유 정도가 아닐까 싶을 것이다. 투자은행가는 보통 스스로를 ‘고임금 노예’라고 여긴다. 인권운동가는 한 시간에 1달러쯤 받는 착취 노동자를 노예라 부르지만, 그들은 그래도 보수를 받으며 스스로 떠나갈 수도 있다. 노예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오늘날 노예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아프리카에는 전쟁에서 잡혀오거나 대를 이어 내려오는 수만 명의 가정 노예가 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인신매매꾼들은 200만 명을 매춘과 노동에 강제로 밀어 넣는다. 세계에서 가장 노예가 많은 아시아 남부에는 1천만 명의 약자들이 억류되어, 구닥다리 스타일로 합법을 가장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도망가지도 못한다.
선진국 일부에서도 불법적인 현대 노예를 부리고 있으며, 몇몇 사람이 그에 맞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2001년 초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핵심 참모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 달 전 법제화된 인신매매 및 폭력희생자보호법을 강력하게 시행했는데, 그 법은 국내 인신매매자들을 기소하고 외국 정부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국내에서는 기독교 복음주의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2003년과 2004년 유엔 총회 연설을 포함한 각종 연설과 성명서를 통해 의지를 널리 알렸다. 100건이 넘는 반인신매매법과 1만 건이 넘는 국내외 인신매매 유죄판결을 통해 확고한 입장을 과시한 미국 국무부는 조용하고도 더욱 공을 들인 작업으로 세계 노예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2000년과 2006년 사이 미국 법무부는 인신매매 관련 기소 건수를 3건에서 32건으로 늘렸고(미국 법무부의 인신매매 관련 기소 건수가 3건에서 32건으로 늘었고??), 유죄판결은 10건에서 98건으로 늘렸다(늘었다). 2006년까지 27개 나라가 반인신매매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내에서 해방된 현대 노예는 2%도 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매년 1만7500명의 새 노예가 억류 상태로 들어간다.
서방 세계의 노력은 노예제도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출발부터 삐딱했다. 미국에서는 페미니스트 및 복음주의 운동가의 강력한 연대로 부시 행정부의 초점은 섹스 무역에 집중되었다.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자발적인 매춘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업적 성매매가 오늘날 노예제도의 주류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대부분의 매춘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은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미국의 압력에 굽혀 인간 무역에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 하지만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모든 대륙에서 규제받지 않는 에스코트 서비스는 인터넷을 타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비록 입장이 분명한 몇몇 정부가 희생자에게 임시거주권을 주는 등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확실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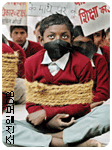
많은 사람이 성노예에 대해 특히 불쾌해 하고, 사실 그렇다. 나는 직접 보았다. 한번은 부카레스트 윤락가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소녀를 중고차와 바꾸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상업적 성매매에 잡혀 있는 여자나 어린아이 한 명에 대해 집안일, 농사 등 노동에 붙들려 있는 노예 숫자는 최소 15명꼴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뚜쟁이나 마약거래상을 잡아넣어 봤자 전체 노예 숫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한다. 비록 매춘 근절이 정당한 대의이기는 하지만, 모든 매춘 종사자가 노예이거나 모든 노예가 매춘 종사자라는 생각에 근거한 서방의 정책은 모든 희생자의 고통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대부분의 정부를 역사의 바보로 만들 수 있는 함정이다.
목숨을 빚지고
그가 남자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고누 랄 콜(Gonoo Lal Kol)은 현대 가장 전형적인 노예를 대표한다(그의 요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세계 다른 수많은 노예처럼 고누는 빚에 묶여서, 인도의 채석장에서 일한다. 그 역시 문맹이며, 자신을 억류하는 것이 불법이고 자신을 억류한 주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는 자신의 4피트 높이 암굴 헛간에서 10여 차례 나와 대화를 나누며 ‘인도의 기적’의 이면을 들려주었다.
고누는 세계 빈민의 8%가 모여 사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의 시골구석 로하가라 달(Lohagara Dhal)에서 산다. 나는 2005년 12월 어느날 저녁 더러운 넝마를 걸친 다른 20명의 노동자와 함께 그를 만났다. 그들 뒤로는 채석장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유랑민족인 콜(Kol)족에 속하는 고누는 그곳 갱에서 가족과 함께 하루에 14시간을 일한다. 그가 쓰는 연장은 둔탁한 망치와 쇠못뿐이다. 손바닥은 굳어 딱딱하기 이를 데 없고, 손가락 끝은 닳아 문드러졌다.
고누의 주인은 크고 억세며 퉁명스러운 도급자로서 이름은 라메시 가르그(Ramesh Garg)라고 했다. 가르그는 영국 식민지 시절 세워졌으며 지금은 600명 가까운 채석장 도급자가 모여 사는 인근의 꽤 큰 도시 샹카르가(Shankargarh)에서 가장 잘 사는 축에 든다. 그는 노예 가족에게 알코올, 곡식, 최소한의 생존비용 외에는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켜 돈을 모았다. 가르그에게 노예는 바위를 규토로, 색유리로, 자갈로 만들어 내는 도구일 뿐이다. 노예학자 케빈 베일(Kevin Bales)의 추산에 따르면, 19세기 미국 남부의 어느 노예가 자신의 몸값을 갚으려면 20년을 일해야 한다. 고누와 다른 노예들은 가르그 밑에서 2년 일했다.
로하가라 달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은 노예다. 하지만 최소한 이론적(형식적??)으로 가르그는 그들을 사들이지도, 소유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10달러도 안 되는 돈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이곳 이자는 1년에 100%가 넘으며, 현대 인도 법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대부분의 빚은 최소한 2대에 걸쳐 내려간다. 그것은 가르그가 사기로 만들어내고 폭력으로 유지시키는 허구일 뿐이다. 고누의 노예 생활의 시작은 62센트를 빌린 것에서 비롯된다. 1958년 그의 할아버지는 자신이 일하던 농장 소유주에게서 그 돈을 빌렸다. 3대에 걸친 자손은 3명의 주인을 거치고, 고누의 가족은 속박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백만에게 자유를
최근 많은, 대담하지만 돈은 없는 그룹들이 노예의 뿌리를 뽑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그 중 일부는 극적으로 노예를 구출해 내어 명성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점은, 노예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각오가 없으면 노예해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타르프라데시의 콜족 사이에서는 프라가티 그라모디요그 산스탄(PGS: Pragati Gramodyog Sansthan; 마을기업을 위한 진보협회)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채석장 도급자의 손아귀에서 수백 가족을 구하는 데 애를 쓰고 있다.
1985년부터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PGS 조직원들은 노예들에게 서서히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PGS의 도움으로 콜족은 소액대출조합을 만들어 채석장 노동자들에게 대출해 주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몇몇 노동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나 양을 사는 등 재산을 소유하고, 빠르게 불어나는 수입을 가지게 되었다. PGS는 초등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팠으며, 대대로 노예뿐이던 마을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PGS의 성공으로 해방은 그저 폐지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선진국에서도 체코공화국이나 스웨덴의 법 집행기관은 인신매매의 가장 나쁜 형태인 노예를 매매하는 뚜쟁이, 파렴치한 노동착취범 등을 기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자 나라에서조차도 지방 경찰이 좀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길거리 단속 수준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노예가 되는 것이 매춘부 같은 인신매매 희생자와 똑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법 집행 기관에 포착된 뒤 다시 인신매매범에게 잡히지 않도록 재활, 교육, 보호 등을 제공해 주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도 몇 안 된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노예 상태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제공된 보호 시설은 이제 그 시작이며, 아직 멀었다.
모든 형태의 속박과 싸우는 것을 설립 원리로 삼은 유엔은 현대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월에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국(Office on Drugs and Crime) 실행이사인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Antonio Maria Costa)는 국제 사회에 대해 인신매매의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노예제도라는 특별한 현상과 싸우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널리 퍼지는 노예제도에 회원국들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데 실패한 유엔에게 몇 가지 제안할 것이 있으며, 그것은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타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인신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해법 가운데 하나는 납치당할 위험이 많은 나라에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유엔 같은 효과적인 국제기구가 없으면 그런 노력은 미국이 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몇몇 나라의 통계 기록을 비판해 왔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특히 인도가 거기에 저항해 왔다. 인도는 1976년 빚으로 인한 노예 신분을 철폐했지만, 시행이 강력하지 않아 수백만 노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대책 사무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은 국무성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로 하여금 인도의 비타협적 태도를 개인적으로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노예제도의 구속력은 강해져가므로 노예제도를 뿌리 뽑으려 노력하는 정부는 노예를 해방하려 애쓰는 그룹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는 인도에 근거를 둔 인간성 증진 및 여성 지위 향상 협회(Society for Human Development and Women’s Empowerment, MSEMVS) 바라나시(Varanasi) 같은 풀뿌리 조직의 활동을 본받는 것이다. 1996년 이 인도 그룹은 노예 상태 아이들이 정규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기술 및 충분한 읽고 쓰기를 배우게 하는 자유학교 전학운동을 펼쳤다. 이 그룹은 또한 엄마에게 초점을 맞추어, 집에서 가내 수공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훈련과 원재료를 제공했다. 성노예로 악명 높은 태국에서는 그와 비슷한 노동권 증진 네트워크(Labour Rights Promotion Network)가 학교를 설립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절망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버마 이민자들을 인신매매 조직에서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나먼 섬나라 아이티 남부에서도 리메 라비(Limy? Lavi: 삶의 빛)와 함께 하는 운동가들이 완전히 고립된 촌락을 돌아다니며 베나빌 레봄 같은 인신매매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비정규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집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돕고 있다. 근래 미국은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출 신호로서 이들 기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4년 동안 나는 내게 노예를 팔겠다고 했던 베나빌 같은 인신매매범에게 억류된 수십 명의 노예를 보았다. 나는 어디에서도 사람을 사지 않았다.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나는 내 조사가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구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누구 한 사람을 구하려는 행동을 자제했다. 때때로 그것이 겁쟁이의 변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진정한 노예해방이라는 어려운 일은 몇몇 선택된 자의 짐일 수 없다. PGS나 MSEMVS 같은 풀뿌리 그룹은 수천 명의 노예에게 자유를 얻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정부가 노예 신분을 적절하고도 간결하게 정의하고, 모든 형태의 범죄를 공격적으로 기소하며, 노예의 자유를 찾아주는 그룹들을 지원하기 전까지 수백만 명의 억류 상태는 계속될 것이며, 노예제도 철폐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리의 약속은 공수표로 날아갈 것이다.
ForeignPolicy.com/extras/slavery에서는 필자인 E. 벤자민 스키너가 어느 노예상인과 사람을 놓고 협상하는 대화를 들을 수 있다.
E. 벤자민 스키너(E. Benjamin Skinner) : <너무나 끔찍한 범죄: 현대 노예제도를 직면하다(A Crime So Monstrous: Face-to-Face with Modern-Day Slavery)>(New York: Free Press, 2008)의 저자다.
참고문헌들
이 기사의 출처인 E. 벤자민 스키너의 <너무나 끔찍한 범죄: 현대 노예제도를 직면하다(A Crime So Monstrous: Face-to-Face with Modern-Day Slavery)>(New York: Free Press, 2008)는 유례없는 세계 노예 무역의 적나라한 실태와 노예 무역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여 준다.
현대 노예의 또 다른 실상은 케빈 베일(Kevin Bales)의 <일회용 인간: 세계 경제의 새로운 노예(Disposable People: New Slavery in the Global Econom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에 나와 있다. 수잔 마이어스(Suzanne Miers)는 <20세기 노예제도: 또 하나의 세계 문제의 대두(Slavery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Evolution of a Global Problem)>(Lanham: AltaMira Press, 2003)에서 지난 100년간 세계 반노예운동의 자취를 추적했다. ‘21세기 노예(21st-Century Slaves)’(National Geographic, September 2003)에서 앤드류 콕번(Andrew Cockburn)은 보스니아에서 코스타리카까지 인간 밀수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미국 국무성의 연례 ‘인간 거래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는 이 문제를 통계 수치화했다. Foreign Policy와 평화기금(Fund for Peace)이 만들어낸 ‘실패 국가 지수(The Failed States Index)’는 국제 밀수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취약 국가들을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