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공부의 신>을 보면 공부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부는 물론 스포츠·예술·격투기·도박 등 모든 분야에는 나름대로 고수들이 존재한다. 투자, 특히 펀드투자의 세계에도 당연히 고수가 존재하는데, 이번호에서는 펀드투자 고수들이 즐겨 쓰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1998년에 <WORTH>가 선정한 ‘최고 투자상담가 300인’에 뽑힌 래리 와슈카의 저서 <게팅 리치(Getting Rich)>에 나오는 ‘하키 퍽 이론’은 펀드투자 고수의 비결을 잘 시사하고 있다.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에게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다른 선수들보다 빠르지도 않고, 퍽(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쓰이는 둥글납작한 검은 고무 뭉치) 다루는 솜씨도 날쌔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지요?” “내 동료나 상대방 선수들은 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만 저는 퍽이 올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달려갑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이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고, ‘시장이 있었던 곳’에 투자한다.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할 때 비로소 시장에 뛰어드는 하수들은 영락없이 ‘고점매수, 저점매도’의 늪에 빠져 시장 수익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익률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수들은 오히려 남들이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환매 시점에서 향후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경제의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경기와 주식시장 및 금리에 대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투자자가 바로 고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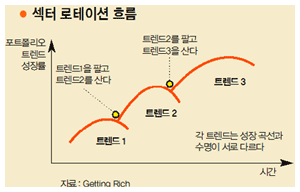
고수는 큰 흐름 읽어
흐름을 읽는 고수들은 헐값에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는 약세 시장을 반기며 실전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을 통해 하수들이 보태 주는 남다른 성과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고수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도 알고 나면 별게 아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조금만 공포감을 이겨내고, 시장이 좋을 때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된다.
섹터 로테이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첫째는 ‘시장에는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섹터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섹터는 산업·국가, 아니면 특정 타입의 자산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수출·내수 등의 산업별, 국내·선진국·신흥국 등의 국가별 섹터와 주식·채권·예금 등 기본적 자산 형태는 물론, 금·원자재·농산물·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별 섹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한 해 동안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은 엄청났지만, 7%대의 고금리 특판예금이나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2009년 천연자원의 수익률은 다른 어떤 섹터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았다.
셋째는 ‘투자자는 강세장에 들어가서 트렌드가 약세로 변하기 전에 정확히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의 고수라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섹터가 강세장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트렌드가 약세로 전환하기 전에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달러 약세로 인해 급등한 금·원유 등을 예로 들어보자. 고수들은 달러 약세를 커버할 수 있는 금이나 원유 등 천연자원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뒀다.
넷째는 ‘가장 실적이 좋은 섹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가정이지만 실제로 고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법이다.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자유자재로 리밸런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고수라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내공이 뛰어난 실전고수들처럼 가장 좋은 섹터에 자산을 집중할 수는 없더라도 가장 좋은 섹터에 가장 많은 배분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고수들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섹터를 찾아내어 그것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한다. 물론 이때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프를 활용하는데, 지난 6개월 혹은 1년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바닥을 쳤음을 확인한다. 바닥이 어느 지점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오름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바닥을 치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때 매입하는 것이다.
고수는 바닥을 좋아해
섹터 로테이션 전략은 서로 다른 자산 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도 크게 국내와 해외 두 개의 섹터로 나눌 수 있고, 해외는 다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등 다양한 섹터로 나누어 수익률을 추세 분석하면 섹터별로 수익률이 로테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2008년까지는 장기 저성과 펀드로 대표적인 리밸런싱 대상이었지만, 지난 한 해만 돌이켜 보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섹터다. 남들이 전부 러시아를 기피하고 싫어할 때 바닥을 좋아하는 고수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비중을 확대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을 정확히 읽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고수가 아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처럼 절세의 고수라면 모든 자산을 가장 유망한 자산에 올인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하수일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섹터 로테이션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고수가 아닌 투자자들이 섹터 로테이션 전략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밸런싱 전략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은 바로 ‘분산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큰 자산의 장기투자,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의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고수의 전략은 아닐지라도,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면 자연스럽게 고수의 투자와 비슷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