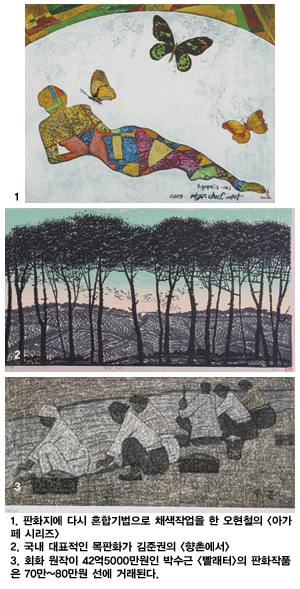
미술품을 구입하다 보면 손쉽게 만나는 게 판화작품이다. 판화는 원작(원판)을 일정한 매수만큼 찍어낸 작품이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초보 투자자들이 차선책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판화만 수집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판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K옥션과 서울옥션이 각각 지난 5월12일과 14일 나란히 판화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를 열기도 했다.
서울옥션은 ‘제1회 판화전’이라고 명시, 판화작품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다. 행사 제목도 ‘오리지널 앤드 오리지널스(Orignal & Originals)’로 정해, ‘판화도 또 하나의 원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판화는 그 자체가 미술의 한 분야다. 일찍이 1958년 박수근, 임직순, 장리석, 변종하, 유강렬, 최영림, 이상욱, 박성본, 최덕휴, 이항성 등이 현 ‘한국현대판화가협회’의 전신인 ‘한국판화협회’를 설립하면서 꾸준히 그 영역을 다져왔다. 그때만 해도 판화는 말 그대로 판화를 위한 원화를 만들어 작업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쇄술의 발달로 평면회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신’을 쏟아내면서 그 본질이 희석되어 왔다.
다양한 형식, 모호해지는 경계
이번 양대 옥션에 출품된 판화작품을 소개하는 판화방식을 열거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석판화, 오프셋 석판화, 실크스크린, 릴리프, 목판화, 에칭, 메조틴트, 아쿼틴트, 드라이포인트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미술계 내부에서조차도 어디까지가 ‘진짜’ 판화이고, 어디까지가 ‘가짜(?)’ 판화인지 가늠하기 힘들 지경이다. 컬렉터들이 다양한 양식의 판화작품들을 앞에 두고 그 차이를 구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목판이든, 에칭이든, 메조틴트든 제대로 판화 원판작업을 한 것은 시각적으로 독특한 그만의 맛을 풍긴다. 그런데 판화작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유화가 훌륭한 인쇄술의 힘을 빌면 그보다 더 산뜻하고 실감나는 색채로 시선을 끈다. 마치 실제 물감을 덧칠한 것처럼 마티에르까지 살아나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순수 판화’보다 ‘변형 판화’가 더 유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돈은 실제 미술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특정한 기법에 따라 작품 가격이 정해지기보다는 ‘작가의 명성’과 ‘시각적 자극’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평생 판화작업만 해온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을 잊게 만들 뿐이다.
칼로 다듬고 파고 긁어내어, 다시 적절한 색을 입히고, 판화지를 얹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찍어낸 ‘순수 판화’들. 단 한 점, 아니면 많아야 10점 이내를 찍어내고 원본은 파기해버린 작업의 결과물들. 반면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원작을 수백, 수천만원에 판매하고, 그 이미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작가나 후손이 다시 300장, 500장씩 찍어낸 ‘변형 판화’들. 팔기 위해 500장을 찍고, 선물용으로 50장을 더 찍고, 작가가 보관한다고 50장을 또 더 찍고. 그야말로 찍고 또 찍어도 누가 몇 장을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미술계 내부의 한탄이다.
화려한 작품 선호 현상 ‘유감’
적어도 시장에서 판화와 프린트(포스터)는 구분돼야 한다. 판화는 인쇄술의 힘을 빌었든, 후손이 찍어냈든, 작가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일정한 부수를 한정하여 찍어내고 그 사실을 판화지 위해 숫자로 남기는 것이다. 작가의 사인이 들어가면 더 바랄게 없다. 프린트는 그런 최소한의 관리와 단속도 없는 말 그대로 주인 없는(?) 인쇄물이다. 넘버링이나 사인 등 출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술계 내부에서도 최소한의 구분선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옥션에 출품된 작품에도 에디션과 사인이 없는 프린트물이 ‘프린트’ 또는 ‘포스터’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팔리고 있어 그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6호 작품 석 점이 일괄로 ‘디지털 프린트’라는 이름으로 나와 120만원에 낙찰됐다. 앙리 마티스의 판화 4점 세트는 ‘리토그라프 포스터’라는 이름으로 40만원에 팔렸다. 당연히 두 작품에는 에디션이나 사인이 없다.
여기서 필자가 어떤 판화가 ‘더 판화답다’거나 ‘돈이 되는 판화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일정한 틀이 깨졌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 또한 판화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시장논리에 맞춰보기에는 능력 부족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판화’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면 50만~150만원선(국내 작가)에서 거래된다. 천경자나 이대원, 사석원, 황규백 등 회화에서 명성 있는 작가의 작품은 윗선에서, 그렇지 않은 보통의 작가는 50만원 내외에서 거래된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화면이 화려하고 세련된 것은 더 인기 있다. 아마도 판화는 ‘큰손’보다는 초보자 위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각적 이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아직도 ‘판화는 원화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차선책’이라든가, ‘투자용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오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래도 판화는 판화다. 판화 하나만을 부여잡고 30년, 40년을 땀 흘린 작가들이 많다. 그들은 누가 뭐라든 상업적 계산과는 거리를 두고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를 다듬고 있다. 판화지 위에 새롭게 채색작업을 하는 신세대 작가들도 있다. 이런 작품은 판화임에도 각기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판화가 유화의 복사본이 아닌, 그 자체가 원본이라는 자존심도 만만찮다. 구매자들도 이왕이면 눈이 즐거운 아류 판화를 좇기보다는, 심플하지만 진품 판화를 찾아 판화만이 주는 매력을 즐기는 법을 스스로 익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