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가무 좋아하는 동이족의 후예라서 그런가. 주변에 ‘한 술’ 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렇게 즐겨 마시는 그 ‘술’, 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지 말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 술’ 한다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이지, 술을 잘 안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다.
영화 속에 나오는 술과 그 안에 숨어있는 술의 의미를 사회·문화적으로 곱씹은 책 <술꾼의 품격>은 그래서 재미나다. ‘일상 속 술의 재발견’이다. 누구나 아는 술인데도 새삼 그 의미를 머금고 꿀꺽 삼켜보면 퍽 감칠맛 난다.
필자는 영화담당기자로 오래 일했던 임범(49) 전 한겨레신문 문화부장이다. 그 자신이 ‘술꾼’인 데다 오랫동안 영화를 봐온 눈 밝은 글쟁이다. <중앙선데이>에 2년간 연재했던 ‘씨네알코올’이라는 칼럼을 다듬어 책으로 엮은 것이 <술꾼의 품격>이다.
책은 럼·보드카 등 스피릿(독한 증류주), 위스키·맥주·칵테일을 비롯해 한국에만 있는 기타재제주(위스키, 럼 등의 원액에 소주·청주를 섞은 저렴한 술) 등 25가지의 술을 다룬다. 연재 당시 해당 매체에 다른 필자가 쓰던 영화 속 와인 칼럼이 있어서 와인은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읽고 나면 누구나 술자리 화제를 주도할 듯한 이 책의 저자와 만나 대한민국 술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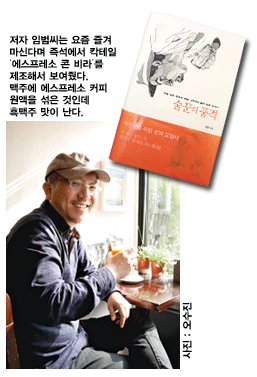
애주가 전직 기자가 소개하는 술의 세계
“술요? 대한민국 일반인들처럼 폭탄주, 소주, 맥주에 익숙하죠. 맛을 잘 아는 수준은 아니고요, 오히려 글 쓰면서 음미하기 시작했달까요.”
한 방울 맛보면 바로 몇 년산 무슨 술인지 맞추는 경지의 술꾼이 아닐까 싶었던 저자는 기대와는 달랐다. 익숙한 ‘주당’ 캐릭터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런 그였기에 오히려 쉽게 지나쳤던 술의 이면이 새로워보였을 게다.
“2000년대 초에 베를린영화제 취재를 갔을 때였죠. 영화인 몇 명과 기자들이 함께 술집에 가서 위스키를 병으로 시켰는데, 그걸 보던 주변의 외국인들이 다 놀라던 기억이 나요. 서구에서는 잔술(스트레이트)로 조금씩 마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병째 시켜 마시는 식으로 술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느꼈죠.”
그가 보는 한국인의 술문화는 이랬다.
“한국에서는 많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서 마시는 걸 좋아하죠. 문화의 집단성이 강하고, 회식도 많고, 사업상 만나는 이들에게도 술로 접대하죠.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사회생활의 일환인 겁니다.”
술꾼이 많은 한국이지만, 의외로 알코올중독자 수는 서양보다 적다고 한다. 서양은 집에서 혼자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양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여럿이 어울려 먹는 문화라서 우려할 정도의 폭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언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라는 자연스러운 인사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국민주는 바로 소주다. 전 세계 판매량 상위에 있는 보드카, 럼은 몇 개 대륙에서 소비되지만 소주는 거의 한국에서만 소비되는데도 세계 7~8위 선에 올라있을 정도로 많이 마신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쌀막걸리 생산과 양주 수입을 금지시켰었는데, 그때 소주가 국민주로 부상하게 됐어요. 희석식 소주가 사실 맛을 음미할 술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소주의 강점은 안주를 돋보이게 해주는 부분 같아요. 서양 술은 향이 강해서 안주가 별로 필요 없지만, 소주는 안주 없이 마실 때보다 안주를 곁들여야 맛있거든요.”
술 자체의 개성이 적은 소주가 사랑받는 한국의 술문화는 맥주의 영역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단다.
“맥주는 나라마다 대표적인 맥주 브랜드가 하나씩은 꼭 있죠.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유요? 맥주 주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생맥주 500 하나 주세요’, ‘(폭탄주용으로) 위스키 하나, 맥주 몇 병 주세요’가 보통 아닌가요? 맥주를 ‘막’ 먹는 문화다 보니 소비자들이 적당히 저렴한 맥주를 많이 찾고, 그러니까 국내 맥주 회사들은 맥주를 고급화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문화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술 자체의 맛에 관심을 갖는 진짜 ‘애주가’들이 꽤 늘어난 것은 아닐까?
“와인이나 싱글몰트 위스키 같은 특정한 술 애호가들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다양한 술을 즐기는 인구는 소수죠. 선인장으로 만드는 술인 데킬라의 경우, 100% 데킬라는 ‘데킬라 아가베’인데, 국내에서는 이 원액 51%에 다른 것을 섞은 ‘데킬라 믹스토’만 팝니다. 세금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입 회사들이 수입을 안한다는 겁니다. 비싸게 100%짜리를 수입해 와도 그만큼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이죠. 100% 데킬라가 아니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요. 물론 수입이 안 돼서 사람들이 안 찾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는 “이런 걸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 술이 필수품이지 기호품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예전에 정부에서 술에 이른바 ‘죄악세’를 물리려는 논의를 하다가 서민들에게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며 물러선 적이 있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술은 기호품 아닌 필수품
“(좋은 술을 찾지 않는) 이런 문화가 국내에 세계적인 명주가 아직 나오지 못한 배경인 것 같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대표적인 서양 술인 위스키만 봐도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에는 ‘선토리’ 같은 유명 브랜드를 개발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스키 수입을 금지시키고 국내 업체에 개발을 독려하다가 시장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되어 오늘에 이르렀죠. 사람들 입맛만 탓할 건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그만큼 못살았고, 정치적 압제가 있었던 역사를 지녔기 때문이니까요. 서양 술 원액에 다른 걸 섞어 만들어 팔던 ‘캡틴큐’니 ‘해태 런던드라이진’이니 하는 기타재제주도 그래서 생겼던 거구요.”
우리의 술문화는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음… 사람들이 술을 적게 마시는 분위기가 대세가 된다면요. 기왕이면 좋은 술, 맛있는 술을 마시자는 문화도 형성될 수 있겠죠. 그 때라면 술도 비로소 필수품에서 기호품으로 바뀔 테지요.”
그는 “술은 맛도 맛이지만 즐겁게 마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술은 공적인 자리에서 마실 때가 많긴 하지만 기왕이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시는 게 좋죠. 술자리 화제도 정치 얘기보다는 사소하고 개인적인 자신들의 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술 마시는 것의 본질은 사실 사람 사귀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