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결정 · 규제는 비효율적…
이익집단의 설득에 넘어가기 쉽다”
항상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입안되고 정책이 결정될까. 때로는 소수의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아닐까. 이익집단들의 로비는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들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나 국회의 역할, 방향 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항이다. 또 이런 문제들은 현대 경제학이 일정 부분 그에 대한 설명과 해답을 줄 수 있고, 또 주어야만 하는 영역이다. 조지 스티글러는 이러한 현대 정치와 경제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유용한 설명을 제시한 경제학자다.
스티글러는 산업구조와 시장기능, 그리고 정부규제에 대한 효과연구에 대한 공헌으로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둥인 시카고대학 출신으로 정부개입의 효율성에 회의를 품고, 자유시장경제를 열렬히 옹호한 자유시장주의자다. 정보경제학의 창시자이자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또 다른 시카고대학 출신 부케넌에 의해 꽃을 피우는 공공선택이론 및 규제경제학의 고안자로도 유명하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 내부의 블랙박스를 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철저히 해부해 정부의 무능력과 이기성을 폭로함으로써 자유시장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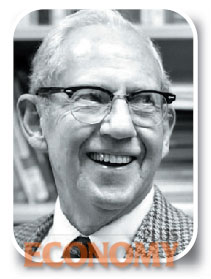
특정집단의 이익에 사로잡히는 집단
시장의 구조, 행동, 그 성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산업조직론 분야에 주요한 공헌을 남겼던 스티글러는 이른바 ‘포획이론’을 구축했다. 포획이론이란 간단히 말해 정부가 특정집단의 이익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단순한 뇌물뿐만 아니라 각종 이익집단의 전문성이나 정보를 통한 감언이설이 활용된다. 극단적일 경우 정부정책과 규제는 특정 이익단체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는 실례로 전기요금 규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공공규제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는 소위 ‘포획이론’으로 정부규제의 허상을 폭로한다. ‘포획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은 그가 1971년에 쓴 ‘규제의 경제이론’이란 논문에서 제시한 것이다. 스티글러는 정부가 그릇된 정책이나 규제를 내놓는 것은 정부관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며, 이익집단의 포획에 의해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혜택을 가져다주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정책이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언뜻 생각하기에 기업은 정부규제를 싫어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그들에게 당장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도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감시역할은 분명 그들을 성가시게 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도 정부규제를 환영할 만한 유인이 존재한다. 특정사업에 관해 몇몇 기업의 참여만 인정하는 규제가 있다고 하자. 일례로 택시사업면허를 제한한다든지 말이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지만,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선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 업체는 일정부분 독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부규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윤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사업자는 이런 규제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고, 정부에 갖가지 수단을 통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정부도 이익단체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정책과 규제를 남발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냥 그들이 이익단체의 말에 속아 그런 건 아니다. 정부 또는 관료, 정치가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이는 공공선택이론에서 주장하는 ‘합리적 무시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2007년 말 한국에선 모 기업의 비자금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때 어떤 언론은 “사회의 흠집처럼 보여도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엔 ‘합리적 무시’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익단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규제를 만들도록 정부를 사로잡는다는 게 ‘포획이론’이라면, 관료나 정치가가 이를 포용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는 게 ‘합리적 무시이론’이다. 그렇다면 ‘합리적 무시’란 뭘까.
예를 들어 철강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가 있고, 정부로 하여금 외국으로부터의 철강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자. 이 경우 수입금지정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100억원이고, 인구는 1억명이다. 또 그들의 로비비용이 5억원이며, 철강을 수입하지 못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200억원이라고 하자.
만약 정부가 철강수입 금지정책을 펼 경우 이 이익단체의 이익은 95억원이 된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입을 손해는 불과 100원(100억원/1억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손실은 200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반대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반대함으로써 자신에게 미칠 손해를 계산해볼 개인이 우선 드물 것이며, 설사 정보를 다 수집해도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금지정책에 반대를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데도 비용이 든다. 무엇보다 이런 비용은 철강수입을 반대함으로써 입는 손해 100원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이익단체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장사가 없다. 5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을 벌 수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이익단체는 일반 국민보다 더 열심히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입장에서는 반대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이 혜택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지 무시한다. 이를 ‘합리적 무시’라고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합리적 무시를 이용해 이익단체 이익에 부합되는 금지정책을 펼 개연성이 크다. 어쨌든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채택하든 무시할 것이지만, 이익단체의 집요한 로비는 성가시기까지 해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결과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합리적 무시 활용하는 정부의 비효율성
포획이론과 합리적 무시이론은 공공선택이론에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한다. 정부나 국회는 극히 일부 이익집단의 감언이설과 논리에 마지못해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정책과 규제를 전개하고(포획이론), 국민은 개별적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이를 무시한다(합리적 무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경제적 효율성 즉, 사회의 경제적 선은 그대로 희생되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티글러의 접근법은 한국 정치와 경제의 접점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한다. 과거로부터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는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정치적 비자금과 기업의 로비문제는 왜 심심찮게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명백히 불합리하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 않는 정책이 왜 집요하게 추진되는 것일까.
이뿐만 아니다. 시내버스는 몇 정거장만 가면 역까지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우리 동네를 빙빙 돌아가는 것일까. 왜 그런 노선이 인가되는 것일까.
물론 국회의 입안사항과 정부의 정책 등이 꼭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꼭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의 구성원도 경제적 인간인 이상 그들의 입장에서 이익을 재규정하고, 손익계산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스티글러와 그 뒤를 잇는 공공선택학파가 지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연찬회 문제 등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일을 상기해보면 스티글러의 설명들이 왜 시사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측면이 있다. 또 대의정치하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을 감시하면서 일반인들의 주의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시민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