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계도 덩달아 위기… 정부가 앞장서 해결책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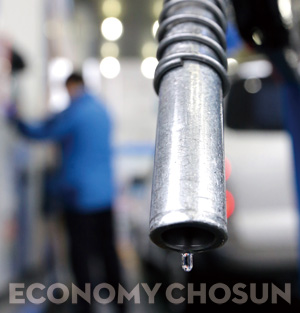
한국 정유업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해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정유업계가 올 들어 흑자로 돌아섰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환경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으로 1분기 매출 12조455억원, 영업이익 3212억원을 기록했다. GS칼텍스의 1분기 정유부문 매출액은 5조44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82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에쓰오일은 1분기 매출액 4조3738억원, 영업이익 238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같은 실적호전은 최근 미국 셰일오일·가스업체 등이 생산을 줄이면서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 컸다. 또 최대 산유국인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했던 요인도 있다. 여기다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며 원자재(원유, 구리 등) 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핵협상 타결로 이란이 원유시장 복귀를 선언한데다, 올 하반기 중동의 대형 정제설비 가동이 본격화되면 국내 정유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 ‘빅3’가 사상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으로 정유 부문 실적이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3개사의 전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224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1977년 이후 37년 만의 첫 영업손실이자, 1980년 SK의 유공 인수 이후 최초의 적자다. 2011년 2조6000억원의 사상 최대 세전이익을 시현한 후 3년 만에 급격히 추락한 것이다.
에쓰오일도 1980년 사업시작 이후 처음으로 적자(2589억원)를 기록했다. GS칼텍스 역시 지난해 45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GS칼텍스가 연간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사상 최악 실적 거둔 정유업계
주가하락으로 이들의 기업가치도 3년 새 75% 증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 23조6000억원(2011년 4월25일 기준)으로 상장사 중 8위 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2014년 12월26일 기준) 8조3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이 4분의 1 토막 나면서 31위로 급락했다.
실적악화로 정유업계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강등됐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지난해 3월 GS칼텍스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의 바로 윗단계인 BBB-로 강등하고, 12월에는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도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 단계(Baa3)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들 정유사의 실적부진 원인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대규모 재고평가손실 발생으로 요약된다. 국내 정유업체의 비즈니스모델은 국제유가하락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구조다. 지리적 입지상 ‘원유도입-생산-판매’까지 35~4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유가하락에 대한 손익변동성이 높아 SK이노베이션의 경우만 해도 유가 1달러 하락 시 재고 관련 손실만 약 47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4분기에만 정유 4사가 재고평가손실과 마진영향으로 1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저유가는 해외 메이저 정유업계에도 타격을 준다. 영국 정유회사인 BP의 스코틀랜드 에버딘 지부는 30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으며 임금을 동결했다. 카타르-셸은 연간 200만톤의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포기했다.
최근 유가급락은 에너지 패권을 두고 벌인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간 ‘치킨게임’의 산물이다. 셰일오일·가스 생산량 확대에 힘입어 미국이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등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기존 원유생산량을 유지해 글로벌 공급과잉 및 유가하락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유가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산유국들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셰일가스 공급이 둔화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국제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기관들은 배럴당 60~70달러대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셰일가스 등 비(非)전통자원 생산원가 하락, 선진국 수요 감소, 중국 수요 둔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저유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유가가 회복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정유업계의 구조적 위기는 아시아 역내 석유수급 밸런스가 무너진 2012년 이후 정제마진 급락으로 시작됐다. 이 수급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실적개선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BP의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석유 소비는 2009년 하루 평균 2624만 배럴에서 2013년 3047만 배럴로 16% 증가했다. 중국의 석유소비가 30% 가량 증가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아시아 역내 정제설비 규모는 하루 2768만 배럴에서 3128만 배럴로 13% 증가했다. 중국의 정제설비 규모는 일 947만 배럴에서 1259만 배럴로 33% 늘어났다.
국내 정유사들의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은 2014년 3월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 전환해 경쟁 상대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17년까지 매년 50만~60만 배럴의 설비 증설이 예정돼 있다.
아시아 역내에 쏟아져 나온 경유·휘발유 제품이 남아돌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수출길을 찾지 못해 국제석유거래시장에 덤핑으로 넘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정유업계는 그동안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석유제품의 60~70%를 수출하는 수출형 비즈니스모델을 갖췄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은 2012년 수출 1위, 2013년에는 2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수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북아 수출형 비즈니스 모델’이 정면으로 위협받고 있다. 아시아 역내 공급과잉으로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역내 새로 지어지는 신규 정유설비 대비 설비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중동, 인도 등에 들어서고 있는 신규설비들은 국내 설비를 압도하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의 평균 고도화설비는 20~30%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인도에 들어선 정유시설의 고도화율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고도화설비는 저렴한 원료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가리킨다.
이러한 역내 경쟁력 열위의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중동산 제품 유입도 가능해 내수시장 기반마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으로 언제까지 손실을 감당하며 누가 먼저 죽느냐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화학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설비 신증설을 통한 중국 화학제품의 자급률 부상과 미국의 비전통자원 기반의 저가원료를 기반으로 한 화학제품 생산으로 국내기업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불도 하나 둘씩 꺼져가고 있다.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SK유화공장은 지난해 7월 이후 가동을 멈췄다.
한국 석유화학제품의 1위 수출시장인 중국은 석탄 등 저가원료를 기반으로 한 자국 내 신증설 설비로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중동·북미에서 에탄(Ethane) 등 저가원료를 기반으로 한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이 쏟아지면서 중국 내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유업계가 무너지면 화학산업의 주원료를 수입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원가경쟁력 유지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화학업계까지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 중국, 중동, 인도 등에 들어서고 있는 신규설비가 한국 내 설비를 압도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전략 찾아야
이러한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위기에 정부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책지원은커녕 고유가·저유가 시대를 막론하고 정유업계 등에 대한 압박에만 골몰해 왔다.
그러나 중국만 해도 정유·석유화학산업이 향후 중국 제조업 부활과 직결돼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4대 국영 정유회사 주도로 자원개발,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 최근 에너지 환경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유가하락에서도 전략적 비축유를 늘리는 등 동북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자국 정유업의 경쟁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유업계 구조조정(석유사업 합리화)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2017년 정유설비 공동활용, 원료조달, 수출에서 정유업계간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도 국내 정유산업이 처한 위기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시대착오적인 고유가시대 정책(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을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담아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존의 기로에 선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정책적 지원과 업계 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