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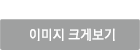
어느 모임에서 만난 모 대학교수가 자신은 요즘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농담이겠지만 이런 용어가 흡사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것이 요즘 세태다. 아기가 운다고 떨어뜨리고, 변심한 애인을 찾아갔다 욱해서 인질극을 벌이는가 하면 운전기사를 학대해서 매스컴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인들까지. ‘분노’가 난무하고 있다.
분노는 상기된 얼굴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눈이다. 흔히 화가 나면 ‘눈이 뒤집힌다’고 한다. 눈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흰자위가 많이 보인다는 뜻이다. 눈동자가 둥둥 뜨거나 내리깔리는 삼백안(三白眼), 놀랐을 때처럼 눈동자 사방에 흰자위가 드러나는 사백안 등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다. 검은 눈동자의 중심이 잘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의 성정(性情)도 중심이 잡힌 것이다.
수십년 친구와 쉽게 틀어지는 이유
눈빛이 눈 속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분노의 한 표현이다. 크게 노하면 눈빛에 살기나 광기를 띤다. 마주한 상대의 눈에 흰자위가 유독 많이 보이거나 눈빛이 번뜩인다면 그때는 분노의 화살이 꽂히기 전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인상학적으로 화를 잘 내는 대표적인 상은 얼굴이 넓적하고 크며 광대가 발달한 사람으로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다. 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 널리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코가 짧아 성질이 급한 사람도 화를 버럭 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풀리기도 빨리 풀린다.
필자가 아는 모 기업인 중에 얼굴이 크고 넓적한 분이 있다. 금실이 남다르던 그는 암 투병하던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다. 그도 건강이 좋지 않아 주변에선 아내를 곧 뒤따라갈 거라고 했는데, 얼마 전 만나보니 건강이 많이 회복돼 있었고 눈빛도 그윽하고 부드러웠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누면서 살아야겠어요.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을 떠나야죠.” 자신이 가진 강한 에너지를 선하게 쓸 줄 아는 그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인상학자로서 필자는 그윽한 눈빛과 자주 웃어 탄력있는 얼굴을 만들어야 좋은 운기를 끌어당길 수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런데 얼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탄력’이다. 마음에도 연골이 있다. 나이가 들어 무릎 연골이 닳더라도 주변 근육이 받쳐주면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의 연골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닳아 쿠션이 없어지고 메말라간다. 어르신들이 쉬 토라지고 화를 잘 내며, 수십년 친구와도 하루아침에 담을 쌓아버리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연골이 닳아서다.
분노는 오래전부터 억눌린 감정이나 현재의 심한 스트레스에서 온다. 몸 에너지가 건강하지 않을 때 정신 에너지가 빗나간 방향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일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은 오후만 되면 신경질이 늘고 자제력이 약해진다.
얼마 전 만난 한 샐러리맨이 두 상사를 비교하는 걸 들었다. 상사에게 똑같이 호되게 혼이 났는데도 한 상사의 경우는 고개를 숙이게 되고, 한 상사에게는 반발심이 든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상사의 경우는 꾸짖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식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혼쭐을 낼 때처럼 말이다. 두 번째 상사의 경우에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식이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반발이 생긴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자칫 부하의 분노로 이어져 하극상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입꼬리를 30초간 올려본다. 연필을 가로로 해 치아로 물어보는 것도 좋다. 입꼬리 근육을 올리는 움직임은 뇌에 긍정신호를 전달해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번득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눈에 담는 것도 좋다. 아쉬운 대로 컴퓨터 화면에서라도 아름다운 숲이나 바다를 보는 것도 좋겠다. 폭력적인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은 멀리해야 한다. 예로부터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눈을 씻고,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귀를 씻으라 했다. 그만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땐 입꼬리를 올려보라
길게 내쉬고 들이쉬는 심호흡으로 단전에 기운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화가 나면 기운이 입으로 눈으로 머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거친 욕설이 나오고 눈이 뒤집히고 머리 꼭대기가 열리는 것이다. 혀는 칼에 다름 아니다. 상대에게 비수로 던진 말이 알고 보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내는 것이다. 단전으로 기운을 내리면 몸과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서 눈빛도 말투도 순해진다. 여기에 주변을 배려하고 베푸는 행동까지 갖춘다면 마음의 연골이 좀 닳더라도 마음 근육이 잘 발달하게 될 것이다.
마음 근육이 탄탄하면 마음 중심이 잡혀서 감정에 눈멀지 않게 된다. 불혹의 나이 마흔이 넘어가면 마음 운동은 쉽게 되지 않는다. 미리미리 단련을 해둬야 ‘분노의 시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훗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다.
▒ 주선희
원광디지털대 얼굴경영학과 교수, 국내 첫 인상학 박사, 20여년간 대학교, 정부, 민간 기업체에서 ‘얼굴경영’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