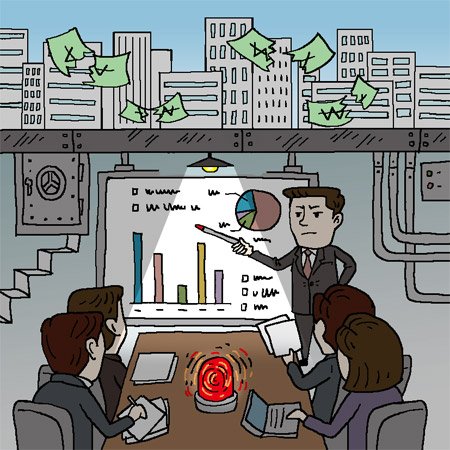
2011년 5월 2일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다. 9·11테러의 복수에 성공했다는 자축 분위기 속에서 이날 미 백악관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이 화제에 올랐다. 오바마 정권의 핵심 수뇌부가 모니터를 통해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지켜보는 장면이었다.
가운데에 앉은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었다. 작전을 맡은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장군이 정중앙을 차지하고 그 옆으로 클린턴 국무장관과 바이든 부통령이 앉았다. 오바마는 한쪽 구석에서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쪼그린 채 긴장된 얼굴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서열 따위 따지지 않는 미국식 실용주의가 인상적이었다.
지구 반대쪽에서 펼쳐진 군사 작전이 생중계된 장소는 어디였을까. 백악관 측은 웨스트윙(서쪽 건물) 지하의 상황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구 곳곳에서 수집하는 모든 안보 관련 정보와 동태들이 집결되는 ‘미국의 신경중추’다. 450㎡쯤 되는 방에 최첨단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전 세계 안보상황을 24시간 감시한다.
그러나 전쟁·테러 등의 비상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지휘부가 집결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다. 백악관 이스트윙(동쪽 건물) 지하벙커에 긴급 사령부가 차려진다. 대통령 비상작전센터(PEOC)로 불리는 지하벙커는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핵공격에 대비해 만들었다. 9·11테러 때도 백악관 안에 없었던 부시 대통령을 대신해 체니 부통령이 이 방에 들어와 상황을 지휘했다. 일명 ‘워룸(war room)’으로 불린다.
모든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해 전시 작전상황실인 워룸을 갖추고 있다. 영국 런던에는 ‘처칠 워룸’이 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처칠은 이 방에서 루스벨트 미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하며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히틀러도 지하 워룸에 숨어 작전을 펼쳤다.
우리 청와대에도 워룸 개념의 지하벙커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시 대피시설로 만들었다가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위기관리 상황실로 개조했다. 육·해·공군과 경찰청 등 안보·위기관리 기관의 상황정보가 실시간 집결되고 첨단 통신 시설이 갖춰져 있다. 1m 두께의 철판 출입문에다 어떤 재래식 폭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군사적 개념이던 워룸이 경제 분야로 확장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미국발 충격이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상황에 이르자 각국 정부가 금융 워룸을 설치했다. 금융위기가 전쟁에 버금가는 비상사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이 금융·경제상황의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종합 대응하는 중앙지휘부를 가동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언하고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을 만들어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야전 점퍼에 선글라스 끼고 현장에 달려가기를 즐기는 MB스타일에 딱 맞았다. 위기를 과장한다거나 쇼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덕분에 한국은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계에서도 ‘워룸 경영’으로 불리는 위기대응 전략이 중요한 모델로 부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 계열사들에 워룸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워룸이란 표현에서 심각한 위기의식이 물씬 느껴진다. SK뿐 아니라 대부분 재벌그룹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글로벌 경기위축과 중국의 부상 등 경영 환경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지금 한국 기업과 산업계는 위기라고 할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마저 고전하고 있다. 비상경영 체제는 경제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다는 뜻이다. 워룸 경영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돌파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