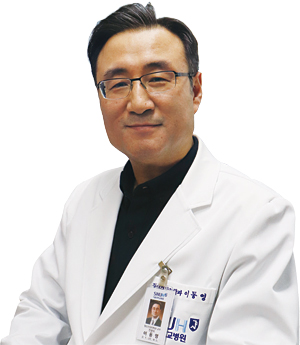
서울대 대학원 정신과학 박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수련이사, 한국치매협회 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치매 및 기억감퇴 클리닉 책임교수 / 사진 전준범 기자
“진료실에 누가 찾아오는지 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낍니다. 10년 이상 지속해온 치매 관리 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겠죠.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갈 길은 멀지만요.”
12월 5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만난 이동영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치매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크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꽤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자신의 외래 환자 부류 변화를 근거로 삼았다.
“10여 년 전에는 이미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 일상생활에 문제 있는 사람, 의사가 굳이 진단해주지 않아도 정상이지 않음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주로 왔어요. 요즘은 경도인지장애군이나 그보다 더 말짱한 이가 진료실 문을 열어요. 관리를 일찍 시작하면 치매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
2000년대 초반까지 치매는 ‘걸리면 약도 없고 대책도 없는’ 질병으로 여겨졌다. 이런 인식을 대변하듯 국가의 치매 관리 초점도 대부분 중증 환자 수용시설에 맞춰져 있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25개 자치구에 순차적으로 ..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