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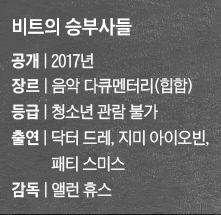
넷플릭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세상을 열었다. 덕분에 음악 팬들도 행복해졌다. 음악 다큐멘터리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볼만한 작품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자서전, 다큐멘터리 문화가 발달한 영미권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음악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이는 곧 음악 문화의 질적, 양적 다양성을 견인해 왔다. 역사와 함께 담론의 두께도 두꺼워졌다. 영어가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파일을 구해 음악 지식을 넓힐 수 있겠으나, 안 된다면 누군가 한글 자막을 제작, 배포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OTT는 그런 이들에게 쏟아지는 성수의 폭포다. 기존에 제작된 작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매년 새로운 작품들이 또 만들어진다. 많은 작품을 추천하고 싶지만, 그중 넷플릭스와 애플TV+의 오리지널 두 편을 소개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명작은 ‘비트의 승부사들(The Defiant Ones)’이다. 이 작품은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U2, 스눕독과 에미넘, 애플과 비츠 일렉트로닉을 묶는 시리즈다. 얼핏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는 조합이다. 하지만 첫 회를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다큐멘터리는 (현재는 애플에 인수된) 세계 최대 헤드폰 회사 비츠의 공동 설립자 지미 아이오빈과 닥터 드레의 일대기를 풍부한 인터뷰로 재구성한다. 본인들을 포함, 주변의 많은 인물이 카메라 앞에서 증언한다. 그 면면이 장난이 아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 보노, 패티 스미스, 스눕독, DOC, 아이스 큐브, 트렌트 레즈너, 피 디디, 켄드릭 라마, 에미넘, 윌.아이.엠, 그웬 스테파니 같은 거물이 줄줄이 출연한다.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약 40년에 이르는 타임라인을 완성한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출신인 아이오빈은 1970년대 초반 레코드 플랜트 스튜디오의 보조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엔지니어로서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1975년 작 ‘Born To Run’이었다. 전작의 실패로 소속사로부터 퇴출 위기에 놓여 있던 스프링스틴은 엄청난 야심이 있었다. “스튜디오를 하나의 연장처럼 사용하고, 비슷한 연주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 조력자가 아이오빈이었다. 마음에 드는 드럼 소리를 만들려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스튜디오에 매달려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능력을 키워나갔다. 첫 프로듀서를 맡은 패티 스미스의 앨범에서는 확실한 싱글을 위해 브루스 스프링스틴으로부터 ‘Because the Night’를 받아냈다. 아이오빈의 연인이던 스테파니 닉스의 앨범을 위해선 톰 페티로부터 ‘Stop Draggin’ ‘My Heart Around’를 받았다.
다른 이에게 좀처럼 곡을 주지 않는 당대 뮤지션들로부터 얻어낸 이 노래들은 패티 스미스와 스테파니 닉스의 최대 히트곡이 됐다. 아이오빈에게는 엔지니어와 프로듀서의 재능뿐 아니라 제작자, 즉 비즈니스맨으로서 능력도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아이오빈은 점점 바빠졌다. 스튜디오에서도 콘솔 앞보다 전화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그리고 1990년 그는 자신의 회사 인터스코프 레코드를 설립한다.
로스앤젤레스(LA) 근교 소도시 콤프턴 출신인 닥터 드레는 글을 깨우치기 전 음반에 붙은 레이블만 보고도 거기에 어떤 음악이 담겼는지를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틀어줄 정도였다고 한다. 힙합 초창기에 동네 나이트클럽 DJ로 데뷔한 그는 동네 친구들과 힙합 그룹을 결성했다. 이지 이, 아이스 큐브, DJ 옐라 그리고 닥터 드레로 구성된 이 팀의 이름은 N.W.A, 그들은 ‘Fuck The Police’가 담긴 희대의 문제작이자 힙합 역사에 길이 남을 명반 ‘Straight Outta Compton’으로 데뷔한다.
멤버들과 불화로 닥터 드레는 팀을 떠나 새로운 레이블 데스로를 설립했고, 역시 명반 중 명반인 솔로 앨범 ‘The Chronic’을 냈다. 갱스터 힙합에 대한 음악 산업계의 거부감, 닥터 드레에게 얽힌 복잡한 문제로 이 앨범을 내겠다는 곳이 없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민 이가 아이오빈이었다. 아이오빈은 말했다. “‘The Chronic’을 듣자마자 이 친구가 인터스코프의 머리(head)가 될 수 있으리라는 걸 알았다.”
데스로는 닥터 드레의 레이블이자 인터스코프 산하 레이블이 됐다. 이 레이블은 곧 스눕독(당시에는 스눕 도기 독), 투팍 샤커 등을 데뷔시키며 1990년대 힙합 붐을 주도한다. 인터스코프는 나인 인치 네일스, 메릴린 맨슨도 데뷔시켰다. 가장 세기말적이었으며, 가장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이 팀들은 그 자체로 1990년대 분위기의 청사진이나 다름없었다. 아이오빈과 드레는 각각 록과 힙합이라는 영역에서 각자의 혁명을 이끄는 동업자가 됐다.
‘비트의 승부사들’은 둘의 인생 역정을 교차해 다룬다. 인터스코프와 데스로를 통해 서로의 타임라인이 교차하는 순간,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음반 산업이 몰락할 때 스티브 잡스와 손잡고 아이튠즈 스토어의 출범에 일조하는 순간, 그들이 비츠를 설립하고 애플과 합병하는 순간 록과 힙합과 산업은 하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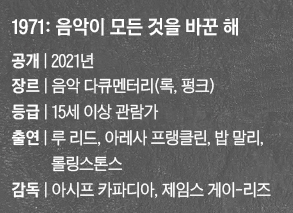
OTT 업계 후발 주자인 애플TV+에도 좋은 작품이 많다. 애플의 기업 문화가 음악을 중시하는 덕일까. 오리지널 작품에 많은 투자를 한다. 토드 헤인즈가 감독한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1960년대 뉴욕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전위예술적 보고서이며 빌리 아일리시의 성공기를 다룬 ‘조금 흐릿한 세상’은 이 시대 가장 핫한 아티스트의 솔직한 자서전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프로듀서 마크 론슨이 직접 진행하는 ‘마크 론슨과 들여다보는 사운드의 세계’는 우리가 무심히 듣고 넘기는 팝의 사운드를 온갖 유명인과 함께 파헤친다. 보고만 있어도 무수한 음표와 소리의 결이 파형처럼 흘러가는 기분이 든다.
오리지널 작품만 있는 애플TV+ 라인업 중에서도 꼭 추천하고 싶은 시리즈는 ‘1971: 음악이 모든 것을 바꾼 해’다. 애플이 자사의 콘텐츠 사업을 위해 설립한 애플 스튜디오엔 할리우드와 팝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이 작품이야말로 그런 애플 스튜디오의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첫 회만 봐도 마빈 게이, 존 레넌, 폴 매카트니의 희귀 영상으로 채워져 있다. 8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이 시리즈는 회를 거듭할수록 감탄을 자아낸다. LSD로 대표되는 1960년대의 약물 문화부터 1980년대 이후 록계에 영향을 주는 펑크의 탄생까지, 1971년이라는 해가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자극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이 해가 왜 팝에 있어서 중요한지,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영상과 듣기 힘들었던 통찰로 전해주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공개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했던 ‘인문과 기술의 교차로’라는 말에 애플의 막강한 자본이 더해지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생생히 증거하는 작품이다.
▒ 김작가
대중음악평론가, 일일공일팔 컨텐츠본부장,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 MBC ‘나는 가수다’, EBS ‘스페이스 공감’기획 및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