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기 중후반에 나온 ‘한진춘추(漢晉春秋)’는 국내에도 꽤 알려져 있다. 동진(東晉)의 문인 습착치(習鑿齒)가 후한 초부터 서진(西晉)까지의 300년 가까운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술한 편년체(編年體) 사서다. 원래는 분량이 제법 많았으나 후일 산일(散逸)돼 그 일부만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이 자주 언급되는 까닭은 삼국(三國) 시대의 정통을 논한 부분이 세인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습착치는 먼저 위(魏)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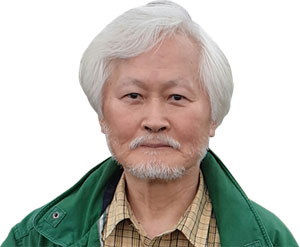
“만약 위가 천하의 왕자(王者)를 대신할 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가 부족했고, 난세를 평정한 공이 있다고 해도 손씨(孫氏)와 유씨(劉氏)의 정권이 함께 정립(鼎立)했다. 도가 부족했으니 당대를 제압했다 할 수 없고, 천하가 위에 제압되지 않았으니 위는 천하의 종주가 되지 못했다. 조씨(曹氏)에게 왕자의 도가 부족했으므로 조씨는 하루도 왕이 된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조조(曹操)가 기틀을 세우고 조비(曹丕)가 문을 연 위나라는 두 사람의 도덕적 결함으로 정통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역사 사실로도 촉(蜀)과 오(吳) 두 나라를 제압하지 못했으므로 종주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미달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유비(劉備)에 대해서는 “한고조(漢高祖)의 후손으로서 그 신의가 당대에 두드러졌다”면서 “망한 한실(漢室)을 이었다 해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또한 “유비는 낭패를 당하고 난관을 맞아도 더욱 신의가 빛났고, 급박하고 위태로운 때에도 말에 도를 잃지 않았다(劉玄德雖顛沛險難而信義愈明, 勢逼事危而言不失道)”고 추켜세웠다. 이는 명백한 ‘촉한정통론(蜀漢正統論)’이다.
습착치의 주장은 앞서 나온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잘 알려진 대로 진수는 삼국을 위, 촉, 오의 순서로 배열하고 조조는 ‘무제기(武帝紀)’로, 유비와 손권(孫權)은 ‘선주전(先主傳)’과 ‘오주전(吳主傳)’으로 다루었다. 또한 조조의 죽음은 ‘붕(崩)’으로, 유비는 ‘조(殂)’로, 손권은 ‘훙(薨)’으로 각각 구분했다. 촉이 망한 30세까지 그가 촉의 관리였던 연고로 촉과 오에 대해서도 차등을 둔 것이다.
이러한 정리 작업 이후 ‘조위정통론(曹魏正統論)’이 오랫동안 대세를 이루었다. 객관적으로도 삼국 정립이라고 하지만 현격한 차이가 난다. 후한 때 구획된 13주(州) 중에서 위가 중원의 9주를 통할한 반면 촉은 서남부의 익주(益州) 한 곳만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형세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또한 촉과 오의 면적이 넓어 보이나 불모지가 많아서 두 나라의 인구를 합해도 위의 절반을 조금 넘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촉한정통론’은 습착치 이후로 거의 눈에 띄지 않다가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구실로 이를 다시 내세웠다. 그는 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위를 정통으로 한 것에 불만을 갖고 ‘통감강목(通鑑綱目)’ 등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그 뒤 성리학(性理學) 보급과 함께 후대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거기에 더해 민간에서도 촉을 정통으로 서술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가 등장해 인기를 끌면서 과거와는 판이한 양상이 펼쳐졌다.
삼국의 역사를 둘러싼 정통론은 소설 ‘삼국지’ 열풍으로 국내에서도 자주 화제가 된다. 이와 함께 작가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삼국지’를 펴낼 때 촉을 정통으로 했느니, 위를 정통으로 했느니 하면서 차별화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정통론은 물론 삼국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분열 시기를 다룰 때는 흔히 논란이 된다. 대체로 각자가 처한 시대 상황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저마다의 사상과 가치 기준 등, 주관적 입장에서 제기하곤 했다.
당(唐) 중기의 황보식(皇甫湜)은 ‘동진원위정윤론(東晉元魏正閏論)’이란 글에서 종족과 문화적인 관점으로 정통성을 논했다. ‘正閏’의 ‘閏’은 정통의 반대 개념이다. 그는 서진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한 뒤 남방에서 명맥을 이어 간 동진과 그 이후의 여러 한족 왕조를 정통으로 보았다. 반면에 선비족(鮮卑族)이 세운 북방의 원위(元魏), 즉 북위(北魏)는 예법과 풍습이 열등해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송 초에 편찬된 백과전서 ‘태평어람(太平御覽)’에서는 고대부터 당(唐)까지의 각 왕조를 ‘황왕(皇王)’과 ‘편패(偏覇)’로 나누었다. 전자는 중앙 정권, 후자는 지방 할거 세력이라는 의미다. 여기서도 삼국의 위는 ‘황왕’, 나머지 두 나라는 ‘편패’로 구분했다. 남북조(南北朝)에 대해서는 남조의 동진만 ‘황왕’으로 인정하고 그 뒤의 송(宋), 제(齊), 량(梁), 진(陳)은 다 ‘편패’로 취급했다. 이에 반해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대를 종식시킨 후위(後魏·북위)부터 후주(後周)까지를 모두 ‘황왕’으로 분류했다. 참고로 ‘자치통감’은 남조를 정통으로 다루었다.
북송 때는 정통에 관한 논의가 특히 활발해 구양수(歐陽脩)와 소식(蘇軾) 등이 ‘정통론’ 여러 편을 지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구양수는 “정통의 ‘정’은 천하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고, ‘통’은 분열 상태를 통합한다는 뜻”이라고 개념을 정리한 다음, “바르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통론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대에도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臺灣)의 중화민국 사이에서 정통성 문제가 있다. 1970년까지만 해도 서방 세계가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한 덕분에 타이완이 유엔(UN) 상임이사국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대세에 밀려 공산당에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한편, 일본에서도 14세기 중후반의 50여 년간 지속된 남북조 시대를 두고 오랫동안 정통론이 이어져 왔다. 교토(京都)의 북조와 요시노(吉野)의 남조에 각각 천황이 존재했으므로 어느 쪽을 정통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를 ‘난보쿠쵸세이쥰론(南北朝正閏論)’이라 한다.
정통론은 정치나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학문이나 사상과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도 거론된다. 유가(儒家)에서는 이를 ‘도통론(道統論)’이라 이른다. 유가 사상과 학문이 천하의 정통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학의 정통을 누가 계승했느냐에 대한 논의다. 맹자(孟子)도 이를 언급한 바 있지만, 당의 한유(韓愈)가 ‘원도(原道)’라는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당시에 성행하던 불가(佛家)와 도가(道家) 사상을 견제하고 유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이를 제창했다. 그 뒤 북송의 정이(程頤)와 남송의 주희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논의는 더욱 활발히 전개된다.
불교에서는 특히 선종(禪宗)의 ‘법통론(法統論)’이 유명하다. 당송(唐宋)과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전등록(傳燈錄)’은 이를 골간으로 한다. 그중 다음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달마(達摩)가 중국에 온 뒤 그 법통이 혜가(慧可), 승찬(僧璨), 도신(道信), 홍인(弘忍)으로 이어지다가 사고가 생겼다. 홍인의 수제자 신수(神秀)와 뒤늦게 나타난 혜능(惠能) 중에서 누가 법통을 잇느냐를 두고 격렬한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오조(五祖) 홍인이 비밀리에 의발(衣鉢·가사와 발우)을 혜능에게 전해줌으로써 혜능이 육조(六祖)가 됐다. 그는 신수 세력의 핍박을 피해 곧장 남방으로 망명, ‘남종(南宗)’을 열었다. 신수는 북방의 도성 일대에서 포교해 크게 신망을 얻었다. 그 뒤 그들의 제자 사이에서 어느 쪽이 진정한 법통을 이었는지를 두고 한동안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슬람교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정통성 다툼으로 대립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간혹 ‘법통론’이 제기된다. 이른바 ‘임정(臨政)법통론’이다. 마침 헌법 전문(前文)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래서 특히 삼일절을 즈음해 이에 관한 논란이 곧잘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역사는 진영 논리나 이해관계, 사상과 감정 등의 주관적 입장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하려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