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꽃을 지칭하는 말은 대단히 많다. ‘련(蓮)’과 ‘하(荷)’ 말고도 ‘부용(芙蓉)’이나 ‘부거(芙蕖)’ 또는 ‘함담(菡萏)’ 등이 있다. 연근은 ‘우(藕)’라 한다. ‘연뿌리는 끊어져도 실은 이어져 있다’는 ‘우단사련(藕斷絲連)’이란 숙어가 더러 쓰인다.
고대에는 이러한 명칭에도 차이가 있었다. 전한 때에 나온 사전인 ‘이아(爾雅)’의 ‘석초(釋草)’ 편은 ‘하(荷)’를 ‘부거’라 한 다음 “그 꽃은 함담, 그 열매는 련, 그 뿌리는 우(其華菡萏, 其實蓮, 其根藕)”라고 설명했다. 후한 때의 허신(許愼)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련은 부거의 열매(蓮, 芙蕖之實也)”이며 “하는 부거의 잎(荷, 芙蕖葉)”이라고 구분했다. 삼국시대 위(魏)의 장읍(張揖)이 ‘이아’를 증보한 ‘광아(廣雅)’에는 “함담은 부용이다(菡萏, 芙蓉也)”라고 적혀 있다. 또 수(隋)나라 때의 유작(劉焯)이 지은 ‘모시의소(毛詩義疏)’에는 “부거의 줄기는 하이고, 그 꽃이 피기 전에는 함담이며, 핀 뒤에는 부거이다(芙蕖, 莖爲荷, 其華未發爲菡萏, 已發爲芙蕖)”라는 해설이 보인다.
이처럼 저마다 내용이 다르다. 삼국시대 위의 조비(曹丕)는 ‘추호행(秋胡行)’에서 “부용은 향기를 머금고, 함담은 꽃을 드리운다(芙蓉含芳, 菡萏垂榮)”고 하고, 같은 시기 유정(劉楨)도 ‘공연시(公宴詩)’에서 “부용은 그 꽃을 피우고, 함담은 금빛 못에 넘친다(芙蓉散其花, 菡萏溢金塘)”고 하여 둘을 별개의 식물처럼 묘사했다.
연꽃은 ‘시경’에도 등장한다. ‘진풍(陳風)’ 의 ‘택피(澤陂)’ 제1장에서는 “저 못가의 둑에, 창포와 연꽃이 있네(彼澤之陂, 有蒲與荷)”라고, 제3장에서는 “창포와 함담이 있네(有蒲菡萏)”라고 했다. 또 ‘정풍(鄭風)’의 ‘산유부소’ 편에서는 “산에는 산앵두가 있고, 늪에는 연꽃이 있다(山有扶蘇, 隰有荷華)”라고 노래했다.
후한 때에 지어진 ‘고시십구수(古詩十九首)’ 중에는 애절한 그리움으로 혼자 연꽃 따는 장면이 보인다. “강 건너서 연꽃을 따니, 난초 못에는 아름다운 풀도 많구나. 이를 따 누구에게 주려 하나? 그리운 사람은 저 먼 길에 있는데. 고개 돌려 고향 바라보지만, 긴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네. 마음은 같으나 떨어져 있으니, 근심으로 늙어간다오(涉江採芙蓉, 蘭澤多芳草. 採之欲遺誰, 所思在遠道. 還顧望舊鄕, 長路漫浩浩. 同心而離居, 憂傷以終老).”
당 말기의 이상은(李商隱)에게는 이러한 연꽃이 더할 나위 없이 고귀했다. 특히 붉은 꽃이 널따란 푸른 잎과 함께 어울릴 때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런 만큼 잎과 꽃이 함께 시들어 감을 누구보다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증하화(贈荷花)’라는 6구절의 시에서다. “세상의 꽃과 잎은 서로 어울리지 않으니, 꽃이 금빛 화분에 들어가면 잎은 먼지가 됩니다. 오로지 연꽃의 푸른 잎과 붉은 꽃만이, 오므리고 펼치고 열고 닫음을 자연에 맡긴답니다. 이 꽃과 이 잎이 늘 서로 비추는데, 푸른 잎 줄고 붉은 꽃 시들면 사람을 죽도록 수심케 합니다(世間花葉不相倫, 花入金盆葉作塵. 惟有綠荷紅菡萏, 卷舒開合任天真. 此花此葉常相映, 翠減紅衰愁殺人).”
남송(南宋) 초의 대표적 시인 양만리(楊萬里)는 어느 날 아침 지인과 함께 항주(杭州)의 서호 부근에 있는 정자사라는 절을 나와 호수에 가득 핀 연꽃을 보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효출정자사송임자방(曉出淨慈寺送林子方)’이란 칠언절구다. “마침내 서호에 6월 중순이 되자, 그 풍광이 다른 계절과 같지 않아요. 하늘 이은 연잎 한없이 푸르고, 햇빛 비친 연꽃 유달리 붉어요(畢竟西湖六月中, 風光不與四時同. 接天蓮葉無窮碧, 映日荷花別樣紅).”
연꽃이 불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백거이(白居易)도 그런 의미에서 연꽃을 노래한 적이 있다. 40대 중반이던 815년 장강(長江) 중류의 심양(潯陽)으로 좌천된 그는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에서 흰 연꽃을 보고 그 소회를 다음 장시로 서술했다. ‘심양삼제(潯陽三題)’ 중의 ‘동림사백련(東林寺白蓮)’이다. “동림의 북쪽 못 물은, 깊기도 깊지만 바닥까지 맑게 보여. 그 가운데에 흰 연꽃이 생겨나와, 봉오리가 삼백 줄기나 되네. 흰 해에 아름다운 빛 내뿜고, 맑은회오리바람 꽃내음 흩날린다. 향기 새는 은 주머니가 터진 듯, 이슬 쏟는 옥쟁반이 기운 듯. 나는 먼지 때 가득한 눈으로, 이 보배로운 꽃 보기 부끄러워. 비로소 붉은 연꽃을 알았나니, 헛되이 맑고 깨끗한 이름을 얻었구나. 여름 꽃받침은 붙어 시들지 않고, 가을 씨방은 맺혀 이제 익었다. 밤 깊어 여러 중 자는데, 홀로 일어나 못을 돌며 걷는다. 씨 하나 거두어, 장안성으로 보내고 싶은데. 다만 이 산 나가면, 속세에 심어 살지 못할까 두렵다네(東林北塘水, 湛湛見底清. 中生白芙蓉, 菡萏三百莖. 白日發光彩, 淸飆散芳馨. 泄香銀囊破, 瀉露玉盤傾. 我慚塵垢眼, 見此瓊瑤英. 乃知紅蓮花, 虛得淸淨名. 夏萼敷未歇, 秋房結才成. 夜深衆僧寢, 獨起繞池行. 欲收一顆子, 寄向長安城. 但恐出山去, 人間種不生).” 화려하고 현란한 붉은 연꽃보다 흰 연꽃이 더 맑고 깨끗하여 높이 쳤다는 점이 다른 시인의 작품에 비해 이채롭다.
연꽃은 실용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크다. 젊은 여인들이 연꽃이 가득 핀 연못 속에서 쪽배를 타고 다니며 연잎이나 연밥을 따는 모습이 아기자기한 정경을 자아낸다. 시인들이 이런 장면을 노래한 것이 ‘채련곡(採蓮曲)’이다.
최초의 ‘채련곡’은 한나라 때 나온 다음의 악부시(樂府詩)다. “강남에선 연 따기 좋다네. 연잎이 어찌 저리도 많은가. 물고기는 연잎 사이에서 논다. 물고기는 연잎 동쪽에서 놀고, 물고기는 연잎 서쪽에서 놀고, 물고기는 연잎 남쪽에서 놀고, 물고기는 연잎 북쪽에서 노는구나(江南可採蓮. 荷葉何田田. 魚戱荷葉間. 魚戱荷葉東, 魚戱荷葉西, 魚戱荷葉南, 魚戱荷葉北).”
성당(盛唐)의 왕창령(王昌齡)은 ‘채련곡’ 2수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궁녀 같은 여인들이, 연 따는 배 다투어 몰다 물이 옷을 적셨다. 올 때는 나루터에서 꽃이 맞아들이더니, 다 따고 나자 강 머리에 뜬 달이 보내주누나(吳姬越豔楚王妃, 爭弄蓮舟水濕衣. 來時浦口花迎入, 採罷江頭月送歸).” “연잎과 비단 치마가 한 색으로 맞춘 듯, 연꽃이 얼굴 향하니 양쪽에서 꽃이 핀 듯. 어지러이 못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더니, 노랫소리 듣고서야 사람 오는 기척을 느꼈다네(荷葉羅裙一色裁, 芙蓉向臉兩邊開. 亂入池中看不見, 聞歌始覺有人來).”
당 말기의 황보송(皇甫松)이 지은 ‘채련자(採蓮子)’ 2수도 눈여겨볼 만하다. “연꽃 향이 열 이랑이나 이어진 못 둑에서, 어린 아가씨 놀기 바빠 연 따는 일 더뎌졌네. 뒤늦게야 물놀이하다 뱃머리가 젖어, 다시 붉은 치마 벗어서 오리에게 씌운다네(菡萏香連十頃陂, 小姑貪戱採蓮遲. 晚來弄水船頭濕, 更脫紅裙裹鴨兒).” “배가 호수 빛 일렁이자 물결 반짝이는 가을날, 물가 젊은이 지켜보노라니 배는 물결 따라 흘러가네. 느닷없이 물 사이로 연밥을 던졌다가, 멀리서 사람이 보자 한참이나 수줍어한다네(船動湖光灩灩秋, 貪看年少信船流. 無端隔水拋蓮子, 遙被人知半日羞).”
극히 드물지만 한 줄기에 두 송이의 연꽃이 맞붙어 피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병체련(竝蒂蓮)’이라 한다. 황보송의 ‘죽지사(竹枝詞)’ 에 “연꽃이 꽃받침을 나란히 하면 한마음으로 이어진다(芙蓉竝蒂一心連)”는 구절이 있다. 또 ‘병체련’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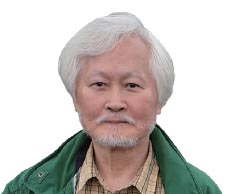
전 서울신문 기자, 전 서울여대 교수
금(金)나라 말에 한 젊은 남녀가 행방불명된 사건이 있었다. 한참 후에 연근 캐던 농부가 연못 가운데에서 두 시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부모의 반대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함께 못에 몸을 던진 것이다. 그해에 거기서 핀 연꽃은 다 ‘병체련’이었다. 당시의 시인 원호문(元好問)이 그 일을 전해 듣고 ‘모어아(摸魚兒)’라는 사패(詞牌)에 가사를 붙여 애도했다. “연뿌리에 묻노니, 실이 얼마나 있으며, 그 속은 누구를 위해 쓰라린지 아는가(問蓮根, 有絲多少, 蓮心知爲誰苦)”로 시작된다.
필자의 거처에서 멀지 않은 양평 세미원(洗美苑)의 연꽃축제 기간이 6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식물을 좋아하는 필자도 아직 가보지 못했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 와 모이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도 만나지 못한다(有緣千里來相會, 無緣對面不相逢)”는 중국 속담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