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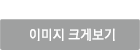

영월은 가족과 함께 떠나기에 좋은 여행지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똑 빼닮은 한반도 지형과 선돌 등 비경이 빼곡하고 김삿갓과 단종 등 역사적 인물과 관련한 유적지도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하다. 강원도 영월 곳곳에 있는 탄광 박물관과 아프리카 박물관 등 흥미롭고 이색적인 박물관과 갤러리도 알찬 여행을 만들어준다.
강은 가을빛에 눈부시고
영월 하면 동강이 먼저 떠오른다. 태백 검룡소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와 대관령에서 흘러나온 송천이 아우라지에서 만나고 다시 조양강으로 이름을 바꿔 정선 가수리에서 동강으로 변한다. 동강은 굽이쳐 흘러 영월까지 흘러 내려오고 어라연 계곡이라는 절경을 빚어낸다.
서강의 풍경도 동강에 뒤지지 않는데, 동강이 계곡을 따라 힘차고 굵게 흘러내린다면 서강은 잔잔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서 우뚝 솟은 선돌과 한반도 지형 같은 비경을 빚어낸다. 한반도 지형은 영월 시내에서 20분 거리에 있다. 서강의 침식과 퇴적이 되풀이되면서 만들어졌는데, 한반도 동쪽의 급경사와 서쪽의 완만함, 백두대간을 연상케 하는 빽빽한 소나무, 땅끝 해남마을과 포항 호미곶 등이 절묘하게 배치된 모습이 하늘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듯 똑 닮아있다.
선암마을에서 영월 방향으로 조금 더 가 소나기재에 차를 대면 선돌이다. 절벽이 반으로 쪼개져 두 개로 나뉘어 있다. 벼락을 맞은 것 같기도 하다. 쪼개진 절벽과 크게 휘돌아가는 강, 강 자락에 일구어놓은 밭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선돌이란 이름은 돌의 모양이 신선처럼 보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푸른 강과 층암절벽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냥 신비로워 신선암(神仙岩)으로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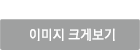
영월에 깃든 비운의 인물들
길은 빙빙 돌아 김삿갓면에 닿는다. 영월은 김삿갓의 고장이라 불린다. 김삿갓으로 기억되는 난고(蘭皐) 김병연은 순조 7년(1807년) 3월 3일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글 읽기와 시 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그는 20세 되던 해 과거에서 홍경래의 난 때 항복했던 김익순의 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 장원을 차지한다. 하지만 뒤늦게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임을 알게 된 김병연은 죄인임을 자처하며 삿갓을 쓰고 방랑한다.
깎아지른 듯한 계곡이 범상치 않은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에는 김삿갓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김삿갓 유적지가 만들어져 있다. 김삿갓의 묘와 주거지, 시비 등을 돌아보다 보면 풍자와 해학, 슬픔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의 일생을 되짚어볼 수 있다. 김삿갓 유적지 옆에 있는 조선민화박물관도 추천한다. 서민의 삶이 녹아내린 옛 그림 3500점을 감상할 수 있다.
김삿갓 말고도 영월에 뼈를 묻은 비운의 인물이 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임금으로 꼽히는 단종이다. 단종은 총명한 왕자였다.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의 뛰어난 학자들이 그의 스승이었다. 세종은 어린 손자를 유난히 귀여워했다. 8세에 세손이 됐고, 10세에 세자로 책봉됐다. 아버지 문종이 임금이 된 지 2년 만에 승하하자 단종은 12세의 나이로 보위를 물려받았다.
어린 임금 주변에서는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삼촌인 수양대군(세조)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황보인과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세조는 3년 뒤 단종을 멀고 먼 강원도 땅 영월로 유배시켰다. 어린 시절 글을 가르쳤던 성삼문과 박팽년, 세자 시절의 스승이었던 이개 등은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발각돼 죽임을 당했다. 이들이 사육신이다. 김시습과 남효온 등은 벼슬을 버리고 은거해 생육신으로 불린다.
청령포는 단종이 귀양살이했던 곳이다. 앞에는 강줄기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벼랑이 솟은 청령포는 천혜의 감옥이다. 유일하게 육지와 이어진 곳은 육육봉이란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어 배가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단종은 17세가 되던 해 12월 사약을 받고, 어린 임금의 시신은 강물에 버려진다. 세조의 서슬 퍼런 후환이 두려워서일까. 아무도 시신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엄홍도라는 관리가 몰래 시신을 수습해 지금의 장릉 자리에 묻었다.
장릉은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강원도에 있는 능이다. 장릉 주변의 소나무가 능을 향해 허리를 굽힌 모습이 이채롭다. 가을볕이 스미는 장릉은 따사롭기만 하다. 능으로 가는 길, 소나무가 울울창창 우거져 있다. 솔잎 사이로 새어 나온 햇빛은 어깨를 따스하게 데우는데, 단종의 슬픔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여행을 떠나온 이들의 발걸음은 차라리 소풍길마냥 평화롭고 다정하기만 하다.
가슴 따스해지는 영월의 옛 풍경을 만나다
영월은 박물관 고을이기도 하다. 사진 박물관과 아프리카 박물관, 베어가곰인형박물관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박물관을 중심으로 여행 일정을 짜도 될 정도다. 영월에 자리한 많은 박물관 가운데서도 꼭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곳이 북면 마차리에 자리한 탄광문화촌이다.
마차리는 한때 무진장의 석탄 광맥으로 번성했던 곳이다. 1935년 조선전력주식회사가 채탄의 첫 삽을 떴던 한국 1호 탄광이 마차리에 있다. 가장 잘나갔을 때는 6만여 명이 모여 살기도 했다. 마차 탄광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잇따라 시찰했던 국가 중요 기간산업 시설이었다. 하지만 ‘개도1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비유했던 마차리의 영화는 1972년 제1차 폐광 이후 쇠락의 길에 들어선다. 지금은 주민 2500여 명이 살아가는 폐광촌이다.
을씨년스럽던 마을에 탄광문화촌이 들어오면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행객도 알음알음 찾아온다. 탄광문화촌에는 1960~ 70년대 영월광업소가 있던 탄광촌 마을 풍경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광부들이 탁주 한 사발로 피로를 푸는 주점과 이발관, 양조장, 배급소와 버스정류장 등 그 시절 그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도, 훈훈하게도한다.
여행수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