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을뿐더러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좋은 존재다. 민생은 어려운데 은행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달가워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은행은 정부 정책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회사다. 예를 들어 금융 당국이 추진한 밸류업(value up·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경우, 4대 금융 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 모두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주요 은행은 모두 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다. 금융 지주회사는 모두 상장사이며, 상장사의 주인은 주주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상장사의 목적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영리법인이 영업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는 배당하고, 일부는 미래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향성은 민생을 위한 대출 가산 금리 인하나 정책 자금 공급 확대 같은 정치적 요구와 상충된다.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은행 같은 규제 산업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여가 자발적인 것인지,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사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좋다.

첫째, 우리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심(bank-based)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중심(market-based) 금융 시스템인데, 우리는 독일과 일본처럼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다.
자본시장이 미성숙하거나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경제에서는 자본을 원하는 특정 섹터에 몰아줄 수 있는 은행 중심 시스템이 특히 유리하다. 은행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주요 경로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40년대 자본이 귀했던 경제 발전 초기, 일본의 통치 세력은 은행을 통제함으로써 기업을 좌지우지했다. 이는 대장성 출신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의 ‘40년 체제’에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당시 일본 상황이 한국의 개발 시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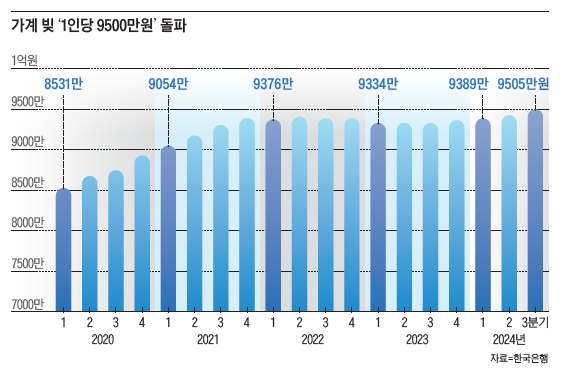
둘째, 우리 금융사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이어지는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경험한 경제적 트라우마가 있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한 정책적 유산을 남긴다. 독일의 경우 1920년 초 하이퍼인플레이션, 미국의 경우 1930년 경제 대공황을 들 수 있다.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무분별한 재정 적자와 통화 발행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이후 독일이 재정 준칙과 통화정책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경우는 정반대다. 대공황 시작으로 꼽히는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이후 제31대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는 1932년까지 금리와 세율을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1930년대 내내 미국을 경제 대공황에 빠뜨렸다. 이러한 경험으로 미국은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트라우마는 환율과 외환보유액 수준에 지나치게 민감한 여론과 은행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관리라는 유산을 남겼다. 이러한 보수적 기조는 금융 규제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바젤 Ⅲ를 2020년부터 도입했지만, 미국은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은행은 바젤 Ⅲ 도입 과정에서 과도한 자본 확충이 은행의 자본시장 중개 능력을 저해하고 경제의 핵심 여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본 관리는 금융의 효율적 중개 기능을 약화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자본 관리와 은행 중심이라는 금융권의 특징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같이 최근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은 성공이 불확실한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 수익이라는 상한이 있는 경우,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낮은 성공 확률, 대규모 투자, 기술 경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누리는 대규모 이익의 속성은 자본시장에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과거 개발 시대의 관점으로 은행권을 바라보고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시대 흐름을 읽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본을 최대한 안전하게 많이 쌓아놓고,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은행이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충분한 자본이 있음에도 담보가 확실한 가계 대출만 하며, 우리가 비싸게 만들어버린 부동산과 함께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