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한(前漢) 말기 원제(元帝) 때의 도성에 이런 동요가 유행했다. “우물에서 물이 넘쳐 나와, 부뚜막의 연기를 끈다. 물은 옥당으로 쏟아져 들어가더니, 다시 금문으로 흘러간다(井水溢, 滅竈煙. 灌玉堂, 流金門).” 그 뒤 성제(成帝) 때 북쪽 궁궐의 우물이 넘쳐 남쪽으로 흘러가는 수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성제가 죽고 15년이 지난 서기 9년에 왕망(王莽)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신(新)을 세웠다. ‘한서(漢書)’의 ‘오행지(五行志)’에 실려 있는 기사다. 우물은 음(陰)이고 부뚜막 연기는 양(陽)이며, 옥당과 금문은 지존(至尊)의 거처다. 이는 곧 음의 기운이 왕성해져 양의 기운을 소멸시키고 궁궐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원제 때 태어난 왕망이 성제 때 출세해 결국 권력을 찬탈한다는 예언이었다. 저자 반고(班固)의 해석이다.
이 ‘오행지’에는 또 성제 때 시중에서 유행했다는 다음의 노래가 실려 있다. “비뚠 길이 좋은 밭을 망치고, 헐뜯는 말이 착한 사람을 어지럽힌다. 단계 나무에 꽃은 피나 열매를 맺지 않고, 누런 참새가 나무 끝에 깃든다. 옛날에는 남의 부러움을 샀는데, 지금은 남이 가엾게 여기누나(邪徑敗良田, 讒口亂善人. 桂樹華不實, 黃爵巢其顚. 故爲人所羨, 今爲人所憐).” 여기서 붉은 단계(丹桂)의 꽃은 적색을 상징 색으로 삼았던 한 황실을 가리키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말은 후사가 없음을 뜻한다. 왕망이 새 왕조를 세우면서 황색을 상징 색으로 정했으므로 누런 참새가 나무 끝에 깃든다는 말은 그가 왕조를 차지하게 된다는 예언이다.
‘후한서(後漢書)’는 이와 유사한 기사를 더 많이 싣고 있다. ‘외효공손술열전(隗囂公孫述列傳)’에 “황소의 흰 배에, 오수가 마땅히 거듭되리(黃牛白腹, 五銖當復)”란 말이 보인다. 후한 건국 당시 촉(蜀) 지역에서 황제를 칭하던 공손술이 동전을 폐지하고 철전을 만들자, 시중에서 불린 동요다. ‘황우’는 이미 멸망한 왕망의 왕조를 상징하고 ‘백복’은 흰색을 내세운 공손술 정권을 가리킨다. ‘오수’는 전한 때 통용되던 화폐다. 즉 천하가 모두 전한의 뒤를 이은 후한으로 귀속된다는 예언이다. 이 열전에는 또 공손술과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 사이에서 ‘도참(圖讖)’에 기록된 예언으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왕복 편지가 소개돼 있다.
‘오행지’에는 순제(順帝) 말 도성에서 널리 전파된 다음의 동요가 수록돼 있다. “활시위처럼 곧은 자는 길옆에서 죽고, 갈고리같이 굽은 자는 도리어 열후에 봉해지네(直如弦, 死道邊. 曲如鉤, 反封侯).” 순제가 죽은 3년 뒤에 강직하기로 이름난 충신 이고(李固)가 외척으로서 권력을 잡고 발호(跋扈)하던 간신 양기(梁冀)의 음해 공작으로 하옥돼 목숨을 잃었다. 시신은 거리에 버려졌다. 그리고 양기와 그 도당은 모두 열후(列侯)에 봉해졌다.
여기에는 또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실려 유명해진 다음의 동요도 보인다. “천리에 걸쳐 돋은 풀, 어찌 저리 푸른가? 열흘을 점쳐도, 살 수는 없으리(千里草, 何靑靑? 十日卜, 不得生).” ‘천리초’를 합하면 ‘동(董)’ 자가 되고, ‘십일복’을 밑에서 위로 연결하면 ‘탁(卓)’ 자가 된다. 이를 ‘파자(破字)’라 한다. 즉 동탁이 지금은 권세를 떨치고 있지만 곧 죽게 된다는 예언이다. 저자 범엽(范燁)이 그렇게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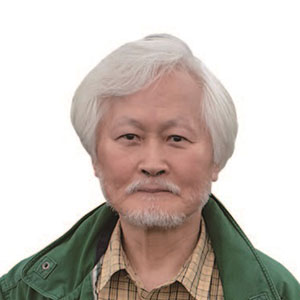
이 밖에 ‘황보숭주준열전(皇甫嵩朱雋列傳)’ 에는 장각(張角)이 황건적(黃巾賊)의 난을 일으키면서 널리 퍼뜨린 다음의 말도 보인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어, 누런 하늘이 서리라. 그해는 갑자년이니,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蒼天已死, 黃天當立. 歲在甲子, 天下大吉).” 갑자년인 서기 184년에 황색 기치를 내건 장각 무리가 청색의 후한 왕조를 뒤엎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난을 일으킨 바로 그해에 장각은 병으로 죽고, 그 일당은 황보숭과 주준에 의해 소탕됐다.
이상과 같은 기사들은 모두 전한과 후한에 걸쳐서 크게 유행하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도참설에서 연유된 것이다. 전자는 음양과 오행의 원리로 세상의 순환 이치와 왕조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도형이나 문자로 장래에 일어날 일과 길흉화복을 미리 맞춘다는, 이른바 예언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참언(讖言) 중에 “망진자호야(亡秦者胡也)”가 있다. “진을 망하게 하는 것은 호다”라는 말이다. ‘회남자(淮南子)’ 의 ‘인간훈(人間訓)’ 편과 ‘사기(史記)’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실려 있다. 진시황이 불사약을 찾아오라고 보낸 방사(方士)가 갖다 바친 책에 이 구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진시황은 북방 호족을 막기 위해 대군을 동원, 몇 년간에 걸쳐 장성을 쌓았다. 그러나 정작 진나라는 그의 아들 호해(胡亥)로 인해 망했다. 도참의 사례는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좌전(春秋左傳)’ 등에도 더러 보인다.
도참과 비슷한 것으로 ‘참위(讖緯)’가 있다. ‘참(讖)’은 신비로운 은어(隱語)로 된 예언이 주류를 이루고, ‘위(緯)’는 유가(儒家)의 경전을 음양오행설이나 도참설을 바탕으로 설명한 책이다. 그러므로 미신적인 내용이 많다. 따라서 위진(魏晉) 시대 이후에는 정통 학문에서 배제됐다. 또한 역대로 정권 찬탈이나 내란 획책 등의 목적으로 그 내용을 제멋대로 해석,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자도 적지 않았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를 금지했다. 관련 서적이 발견되면 모두 수거해 불태우고, 심한 경우에는 소장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어느 시대나 혹세무민하는 자는 있다. 이들에게 속으면 작게는 개인에서 크게는 사회와 국가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혹세무민이란 불순한 목적을 위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논리와 허황한 말로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컫는 가짜 뉴스, 왜곡 보도, 선전 선동, 대중 영합을 위한 사탕발림의 퍼주기 그리고 일시적 인기를 얻으려는 경망하고 가식적인 언동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런 자가 적지 않으므로 중국에서도 예부터 이에 관한 다양한 표현이 나왔다. 어이없는 거짓말 날조로 대중을 현혹하는 ‘조요혹중(造謠惑衆)’, 요사한 말로 대중을 현혹하는 ‘요언혹중(妖言惑衆)’, 사람의 마음을 홀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고혹인심(蠱惑人心)’ 등이다. ‘화중취총(譁衆取寵)’이란 숙어도 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로 일부 수준 낮은 부류의 비위를 맞춰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뜻이다. ‘한서’의 ‘예문지(藝文志)’에서 비롯된 말이다.
불순한 무리의 이와 같은 혹세무민에 속지 않으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널리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순자(荀子)’ 는 ‘해폐(解蔽)’ 편에서 “모든 사람의 근심은 한쪽에 가려져 큰 이치에는 어두운 데 있다(凡人之患, 蔽於一曲, 而暗於大理)”고 말한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한쪽만 아는 사람은 지식의 한구석만 보게 돼 전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를 가식적으로 꾸미니, 안으로는 스스로를 어지럽히고 밖으로는 남을 현혹시킨다(曲知之人, 觀於道之一隅, 而未之能識也. 故以爲足而飾之, 內以自亂,外以惑人).”
스스로 널리 사고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야 무지몽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계몽(啓蒙)이다. 계몽에 나이는 의미 없다. 그런데도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한다면, 개돼지와 같은 중우(衆愚)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의혹으로 공전의 혼란 국면에 처해 있다. 의혹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자료로 풀어야 한다. 그러한 근거와 자료가 제시됐는데도 믿지 않고 애써 부정한다면, 이 또한 인습(因襲)과 수구(守舊)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역경(易經)’에서는 운이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경우를 ‘비(否)’로 그 반대를 ‘태(泰)’로 표현한다. 전자에서는 “소인의 도가 자라나니 군자의 도가 사라지다(小人道長, 君子道消也)”라 하고, 후자에서는 “군자의 도가 자라나니 소인의 도가 사라지다(君子道長, 小人道消也)”라고 한다.
세상 모든 일이 상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 한동안 창궐(猖獗)하던 소인의 도가 사라져가고 있으니 바야흐로 군자의 도가 도래할 때가 됐다. ‘비가 극에 이르러 태가 오는(否極泰來)’ 조짐이 보인다.